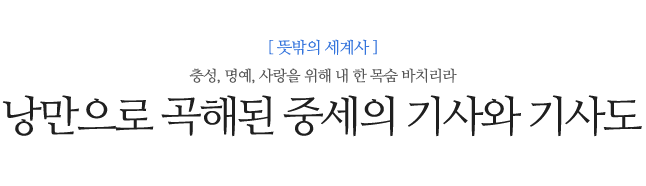테마로보는역사 중세의 기사와 기사도 - 명예와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페이지 정보

본문
돈키호테를 미치게 만든 중세의 기사 모험담
필립 오귀스트 장롱(Philippe Auguste Jeanron), <기사도 소설을 읽는 돈키호테(Don Quichotte lisant les romans de chevalerie) >
19세기경, 수채화, 40.7 x 26.5 cm, 마냉 미술관 소장. <출처: 네이버 미술검색>작품 보러가기
“비쩍 말라 광대뼈가 툭 불거진 오십줄의 이 시골 귀족은...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서재에 쌓여 있는 책을 읽으면서 보냈다. 어찌나 독서광이었던지 이제는 거의 외울 지경이 되어버린 갖가지 기사 소설들을 사들이느라 전답까지 상당수 팔아 치웠을 정도였다... 책의 내용을 현실로 여기며 살았기에 밤마다 모험에서 모험으로, 결투에서 결투로 이어지는 꿈을 꿨다. 그러므로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원수를 비방하느라 입 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이렇게 책에 빠져 지내느라 도통 잠을 자지 못한 탓에 그의 두뇌는 점점 메말라 갔다. 결국에는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그는 이제 어느 것이 허구인지, 또 어느 것이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 호세 마리아 플라사, [처음 만나는 돈키호테] 중
돈키호테가 미친 이유는 설명 그대로다. 중세의 기사 모험담을 너무 읽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유명한 중세의 서사시 [롤랑의 노래(La Chanson de Roland)], [니벨룽겐의 노래(Das Nibelungenlied)] 등에는 용감무쌍하고 멋진 기사들이 수없이 등장한다. 체중을 넘는 갑옷을 입고도 말 위에서 창을 휘두르며 적을 두동강이 내는 전투 장면에선 독자들의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찰나의 공격으로 승부가 갈리는 마상 시합 장면에선 손에 땀이 맺힌다. 또한 귀부인과 밀애를 속삭이는 로맨스 장면에선 침이 꿀꺽 넘어간다.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은 21세기에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17세기에 그 인기란 오죽했을까. 돈키호테는 기사 모험담이 너무 재밌어서 그만 정신줄을 놓고 만 것이다.
중세의 기사와 기사도, 정말 낭만적이었을까?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한 장면. 신념을 위해 전장에서 용맹을 떨치고, 사랑을 위해 목숨도 불사하는 로맨스로 똘똘 뭉친 기사의 이미지는 현재도 끊임없이 재생산 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영화검색>
돈키호테는 현실과 허구를 착각했다. 그런데 과연 돈키호테만일까? 우리들도 기사의 실상과 기사도에 대해 상당 부분 착각하고 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사와 기사도에 대해 떠올려 보자. 기사란 신념을 위해 전장에서 죽어가고 용감하고 정의로우며 심지어 귀부인과 사랑에 빠지는, 게다가 멋진 몸매에 잘생긴 얼굴까지 곁들인 훈남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또한 많은 이들이 기사도에 대해서는 약자를 돕고 주군에 충성하며 가톨릭 수호를 맹세하는, 모든 기사들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기사 모험담이 유행했던 프랑스의 경우, 어느 정도 행세했던 거의 모든 프랑스 가문의 기사들은 십자군 원정 동안 ‘가톨릭을 위해 열렬히 싸우다 전사’한 것이 아니라 전장의 ‘질병과 기아’로 목숨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순간을 겨누는 마상 시합에서 사용된 갑옷은 무려 100kg에 육박해서 말에 올라타려면 기중기가 필요할 정도였다. 움직이는 것은 물론 입고 벗는 것도 결코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더운 여름, 갑옷 안에서 익어가고 있는 기사를 상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사의 필수 조건인 귀부인과의 로맨스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어디까지나 상사의 와이프와 벌인 불륜에 불과하고, 기사 서임식은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기사가 수두룩했다. 유부녀와 사랑에 빠지고 갑옷에 허우적거리며 전쟁터에서는 배고품에 죽어갔던 이 기사라는 집단이, 대체 어디가 낭만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사와 기사도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돈키호테를 미치게 만들었던 기사 모험담, 용맹과 로맨스로 똘똘 뭉친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마저도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기사, 그들은 누구인가
파리 군사 박물관에 있는 갑옷 입은 기사상. <출처: (cc) Rama at fr.wikipedia.org>
우선, 돈키호테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기사’가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살펴보자. 프랑스 지역을 살펴보면 기사는 약 1000년 경에 등장한 집단으로, 이 시기의 기록자들은 기사를 지칭할 때 밀레스(milles)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밀레스는 ‘귀족에 봉사하는 사람’ 혹은 ‘기병(caballarius)’을 의미했다. 기사들이 처음부터 고귀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처럼 보인다. 11세기 경의 기사들은 상당수가 주군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귀족이라기 보다는 농민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12~13세기가 지나면서 기사는 점점 귀족에 편입되고, 귀족 또한 기사를 자처하게 되면서 14세기 무렵에는 기사와 귀족을 바꿔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집단이 동일화되었다.1)
- 콘스탄스 브리텐 부셔, 강일휴 옮김, [중세 프랑스의 귀족과 기사도], (서울: 서신원, 2005), 13-46쪽.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우선, 신분과 관련해 정의하자면, 기사는 넓은 영토를 소유한 국왕, 공작, 백작 등의 대영주와 봉건 계약을 맺었던 소영주들이나 이들의 가신 등이 주로 해당된다. 이들은 대영주들과 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토지를 받는 대신 무력봉사를 약속함으로써 주군을 지켰다. 무력을 사용하고 주군을 지켰던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기사(騎士)’라고 불렸다. 둘째, 대(소)영주나 가신이라는 신분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기사라고 부르거나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의 기사란 일정 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훈련을 받고, 기사 서임식과 같은 특정 의식을 통해 완성된 무인으로 모두에게서 인정받으며, 충성뿐만 아니라 무용, 명예 관념과도 강하게 결부된 존재를 의미한다. 기사 모험담에 묘사된 주인공들이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기사들이다.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중세 중후반이 지날수록 기사의 대부분은 귀족이라고 할 수 있었다.
12세기 이후 창작된 모험담에서는 기사들이 유소년 시절부터 자신보다 고귀한 신분의 귀족 부인(대개는 대영주나 왕의 부인)의 시중을 들며 예의범절을 배우고, 전투에 참가하면서 무술에 통달한 다음 대영주나 유명한 기사에 의해 기사로 서임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온다. 즉,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의범절, 일정기간의 훈련, 기사 서임식 등의 조건이 필요했던 것이다. “귀족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귀족이 될 수 있었지만, 기사는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사가 될 수 없었다.”2)
기사도, 전장의 용맹에 우아한 예절이 더해지다
에드먼드 레이턴(Edmund Leighton), <기사 서임식(The Accolade)>
기사의 충성과 무용을 다룬 무훈시와 남녀 관계의 사랑을 다룬 로망스는 기사도문학의 핵심이었다.
‘기사도(騎士道)’로 번역되는 단어 슈발리(chivalry)는 기병(騎兵)을 의미하는 라틴어 카발라리우스(caballarius)에서 비롯되었다. 이 단어는 중세 프랑스 문학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롤랑의 노래]처럼 기사의 충성과 무용을 강조하는 무훈시(武勳詩)와 기사의 사랑, 남녀 관계를 다루는 로망스(Romance)가 유행했다. 앞서 기사 모험담이라고 설명했지만, 돈키호테가 빠진 것도 정확하게는 바로 이 무훈시와 로망스였다. 이 작품들은 샤를마뉴 시대와 같이 실제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도 했고, 아서왕 시대처럼 있었음직한 시대를 배경으로 삼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의 고드프루아 드 부용(Godefroy de Bouillon: 프랑스 귀족 출신의 십자군을 지휘한 기사)같은 실존 인물뿐만 아니라 아서왕, 랜슬롯같은 허구의 인물들이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전투, 마상 시합, 귀부인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마법이나 경이로움, 초자연적인 것들까지 어우러져 판타지 같은 느낌을 주는 글들도 상당수 있다. 우리가 기사와 기사도에 대해 연상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런 기사문학 덕분으로, 이것들은 기사도 연구의 주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
- [중세 프랑스의 귀족과 기사도], 158-164쪽.
슈발리는 기사로서 지켜야 했던 것으로 충성, 무용, 예의, 명예 등의 덕목을 이상으로 삼는 규범을 의미한다. 그런데 12세기 말까지 슈발리는 어원 그대로 기병의 전사적 속성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명예, 절제 등의 도덕적 함의는 없었다. 대신 명예, 예절 등 귀족들의 고결한 행동 및 처신을 가리키기 위해서 코르트와지(cortoisie, 영어로는 courtesy)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12세기 말이 되면 슈발리에 전투에 필요한 용기, 충성, 완력과 같은 미덕 이상의 것이 덧붙여지기 시작한다. 대다수가 귀족이었던 기사들이 궁정에서는 전장의 용맹과 완력이 아닌 우아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4)
- [중세 프랑스의 귀족과 기사도], 155쪽.
예절을 의미하는 courtesy는 궁전(court)에서 파생된 단어로, 궁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태도를 의미한다. 궁정예절이 기사 및 귀족들의 의식적인 목표가 되면서 코르트와지에 속했던 명예, 염치, 약자에 대한 보호 등이 슈발리에 덧붙여졌다. 더불어 여성에게 정중해야 한다는 점, 점잖고 세련된 화술, 사교춤, 노래, 복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등이 궁전 생활을 하는 기사에게 꼭 필요한 궁정예절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12세기까지의 슈발리가 충성, 용기 등을 의미했던 반면, 12세기 말부터의 슈발리는 명예 수호, 약자, 여성, 그리스도교 수호 등을 폭넓게 함의하며 도덕적, 사회적인 책임까지 부가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올바른 기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12세기 철학자 솔즈베리 존(John of Salisbury)의 답을 보자. “교회를 보호하고, 반역에 대항해 싸우고, 사제직을 존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의에서 구하고, 자신의 고장에 평화를 가져오고, 형제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 5)
- 타임라이프 북스, [기사도의 시대], (서울: 타임라이프, 2004), 92쪽.
누구를 위한 기사도인가
기사는 분명 충성, 무용, 명예 관념과 결부된 고귀한 존재였지만, 중세 내내 그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정의롭고 용감했던 것은 아니다. 무장하고 다니는 기사들을 강력히 제제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 없던 중세 초, 중기 내내 유럽 곳곳은 깡패처럼 난동을 부리는 기사들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특히 기사나 귀족들은 비무장한 사람들이나 성직자에게 폭력을 일삼았다. 이런 폭력적 언동이 얼마나 잦았던지 결국 980년경 남프랑스에서는 주교들을 중심으로 기사들을 설득하는 ‘신의 평화’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의 요지는 간단했다. 기사 및 귀족들에게 비무장한 사람들과 성직자들에 대한 폭력과 약탈을 자제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거였으니 말이다. 그리고 1030년대가 지나 이 운동은 ‘신의 휴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운동은 일주일 중 특정일에는 휴전하여 제발 서로 죽이지 않는 데 합의하자는 것이었다.6) 10세기의 주교와 사제들은 난동을 부리고 다니는 근처의 기사와 귀족들을 설득하러 다니느라 진땀을 뺐다.
- [중세 프랑스의 귀족과 기사도], 40-41쪽.
기사도에서 암묵적으로 정의된 ‘이유 없는 살상 금지’라던가 ‘약자에 대한 보호 규범’ 또한 실전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앞서 예를 든 ‘신의 평화’, ‘신의 휴전’ 운동의 예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폭력으로 점철된 기사들을 진정시키려고 ‘신’까지 동원하지 않았던가. 기사도에 명시된 약자인 여성에 대한 배려는 대부분 상류층 귀족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실전 상황에서 농민 여성들은 무장한 기사들에 의해 포로가 되어 겁탈당하고 학살당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시골의 농민이나 도시의 부르주아같은 자들은 기사도의 보호 대상도 아니어서 언제든지 죽임을 당하거나 재산을 약탈당할 수 있었다.
기사는 과연 전쟁영웅이었나
무훈시와 로망스에 등장하는 전쟁도 실제와는 많이 달랐다. 프랑스의 내로라했던 대부분의 가문들은 가장 격렬한 전투로 알려진 제3차 십자군 전쟁의 아크레 공방전(1191~1192)에서 가족을 잃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이들은 대부분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전장의 질병과 기아로 죽었다. 적진을 향해 멋지게 말을 타고 달려나가 적을 단칼에 베는 전쟁은 없었다. [롤랑의 노래]에 등장하는 프랑스 기사들처럼 적의 머리부터 몸통, 심지어 안장과 말까지 한 방에 해치우는 기사나 [아서왕의 죽음]에 나오는 랜슬롯처럼 철제 투구를 쓴 머리에서 갑옷을 입은 어깨까지 단칼에 적을 두동강 내는 기사는 애초에 있을 수가 없었다. 철제 투구까지 한 번에 작살내려면 대체 완력이 어느 정도여야 한단 말인가?
전쟁 도중 대부분의 기사들은 길을 잘못 들거나 진탕에 빠져서 허우적댔고, 싸움은 일단 시작되면 교착 상태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광스런 전쟁이란 있을 리 없었다. 심지어 백년전쟁 즈음에는 기사들끼리 적을 찌르고 베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적으로 만난 기사들은 서로를 토막냈고, 살아남은 사람은 시체에서 투구를 벗겨 머리를 베어갔다. 물론 몇 명을 죽였는지 제대로 세기 위해서다.
마상 시합은 기사도의 꽃?
장 밥티스트 에두아르 데타이유(Jean-Baptiste-Edouard Detaille), <16세기 마상 시합 장면 (Scène de tournoi au 16e siècle)>
19세기, 수채화, 137 x 117 cm , 파리 군사 박물관 소장. <출처: 네이버 미술검색>작품 보러가기
토너먼트인 마상 시합은 ‘기사도의 꽃’이라 불린다. 마상 시합은 관전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 귀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합을 구경하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용맹을 뽐냈던 자리였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볼거리로 정돈된 마상 시합은 12세기 후반에나 가능했고, 초기의 마상 시합은 패싸움이나 다름없었다. 참가자 수의 제한도 없고, 기사들이 우르르 상대편을 향해 돌진하면서 말에서 떨어뜨리는 게 목표였는데, 규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참가자가 죽는 일도 흔했다.
일대일의 토너먼트 형식으로 정비된 이후에도 갑옷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마상 시합에서 사용된 갑옷은 적게는 80kg, 많게는 100kg에 육박했는데, 시합용 갑옷을 착용한 기사는 움직이는 것은 고사하고 말에 올라타기도 버거웠다. 따라서 참가자들을 들어올려 말에 태우기 위해 기중기도 종종 사용되곤 했다. 게다가 더운 여름의 마상 시합이라면, 갑옷 안의 기사는 더위에 질식해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이다.
일단 시합이 시작되면, 기사의 걱정은 시합에서 지는 게 아니었다. 딱딱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은 마상 시합에서의 방어력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부상을 입을 일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말에서 떨어지면 대형 참사가 될 확률이 높았다. 우리의 환상이 깨지는 이야기이지만, 참가한 기사들은 살아야 했기에 떨어지지 말라고 말안장에 꽉 고정되어 있었다.
빠르게는 13세기부터 서양에서는 르네상스가 일어나 중세보다 더 인간중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무훈시와 로망스 등 중세 기사도문학이 여전히 인기가 있었다. 기사도문학의 상당수가 마법과 마법사 등 마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성을 외쳤던 르네상스 시대에도 여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물론 이런 작품에서 기사와 기사도는 실제보다 매우 과장되어 설명되었고, 기사도문학에 빠진 사람들은 여기에 묘사된 기사와 기사도의 모습을 마치 실제와 유사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에 흠뻑 취해 있었다. 17세기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것도 바로 이런 우스꽝스런 세태를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중세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읽으며 돈키호테를 비웃지만, 한편으로는 기사와 기사도에 대해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 참고문헌
리오브로디, 김지선 옮김, [기사도에서 테러리즘까지: 전쟁과 남성성의 변화], 삼인, 2010; 안 베르텔로트, 채계병 옮김, [아서왕, 전설로 태어난 기사의 수호신], 시공사, 2003; 콘스탄스 브리텐 부셔, 강일휴 옮김, [중세 프랑스의 귀족과 기사도], 서신원, 2005; 타임 라이프 북스, 김옥진 옮김, [기사도의 시대], 타임라이프, 2004; 호세 마리아 플라사, [처음 만나는 돈키호테], 혜원출판사, 2005; 네이버 지식백과.
- 글
- 김지혜
- 글쓴이 김지혜는 문화사 전반에 관심이 많다. 연세대 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문화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석사논문으로 <19세기 후반 영국 정기간행물에 나타난 남성 히스테리>를 제출한 이후, 남성사 및 젠더사 등을 문화사적 관점으로 읽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쉽고 대중적이며 재미있는 역사 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런 관심사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 [르네상스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2010)를 썼다.
주석
1
콘스탄스 브리텐 부셔, 강일휴 옮김, [중세 프랑스의 귀족과 기사도], (서울: 서신원, 2005), 13-46쪽.
2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http://terms.naver3.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71015&categoryId=200000214
3
[중세 프랑스의 귀족과 기사도], 158-164쪽.
4
[중세 프랑스의 귀족과 기사도], 155쪽.
5
타임라이프 북스, [기사도의 시대], (서울: 타임라이프, 2004), 92쪽.
6
[중세 프랑스의 귀족과 기사도], 40-41쪽.
- 이전글파스타, 우아하게 혹은 걸신들린 듯이 - 스파게티를 먹는 사람들 16.02.06
- 다음글운학문(雲鶴紋) 청자(靑瓷) - 고려의 영원한 초상 16.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