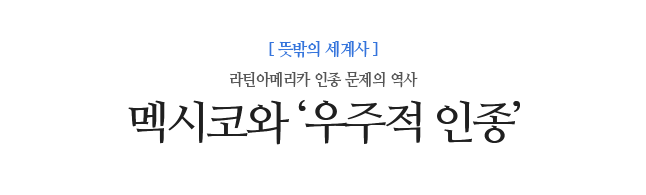테마로보는역사 멕시코와 ‘우주적 인종’ - 라틴아메리카 인종 문제의 역사
페이지 정보

본문
유럽이 되고 싶어라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대성당(Catedral Metroploitana). 오랫동안 유럽 백인들에게 정복당한 라틴아메리카는 유럽을 모방하였고, 멕시코 역시 스스로 유럽화되고자 했다. <출처: (cc) rutlo at commons.wikimedia.org>
지난 연재 라틴아메리카 인종 문제의 역사 - 하얀 아르헨티나에서 ‘사막의 정복’ 작전을 통해 유럽인과 같은 백인들의 나라를 꿈꿨던 아르헨티나의 예를 살펴보았다. 당시 진보적인 철학자로 분류되었던 바우티스타 알베르디(Juan B. Alberdi, 1810~1884)는 이러한 백인화 정책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는 백인 인구가 증식되어야만 진정한 지배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유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백만 명의 이주민들이 유럽에서 아르헨티나로 유입되면서 아르헨티나는 ‘표백’되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아메리카의 파리’로 불렸다. 그런데 19세기 말 유럽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은 아르헨티나만이 아니었다. 멕시코나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등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유럽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모방하고자 했다.
이러한 경향은 1870년대 이후 정치적 안정을 이루게 되면서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중앙 집권적인 독재 혹은 과두제 형태의 정치체제를 갖춘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국내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결국 이들의 선택지는 유럽에 1차 산물을 수출하고, 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산물을 수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의 차관을 들여오는 수밖에 없었다. 부족한 노동력은? 그 역시 유럽 이주민들로 채울 수밖에 없었으니, 라틴아메리카는 정말 유럽 혹은 유럽의 것이 되어버렸다.1) 이렇게 라틴아메리카의 유럽화, 그리고 백인화는 그네들의 정치ㆍ경제적인 상황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 위트있게도,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상류층은 돈 쓰는 방법, 의복, 생활양식, 건축양식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애호, 그리고 사회 정치ㆍ경제적 개념의 유행까지 유럽의 감각을 모방했다. 그들이 모방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유럽의 생산수단뿐이었다.”
20세기 초까지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고, 아르헨티나에 못지않은 차별과 탄압이 각국 원주민들에게 향했다. 라틴아메리카를 정복한 백인들에게 있어서 원주민이나 혼혈의 문화는 열등하고 전근대적인 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멕시코도 마찬가지였다.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 즉 ‘새로운 스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스페인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부왕령으로 오랫동안 존재했던 멕시코. 독립 이후 멕시코 역시 자신들의 피부색을 보다 더 하얗게 칠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20세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멕시코에서는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멕시코 혁명과 인디헤니스모
지난 글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1910년부터 시작된 멕시코 혁명은 포르피리오 디아스(José de la Cruz Porfirio Díaz Mori, 1830~1915)의 독재 체제와 외국 의존적인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특히 멕시코 혁명은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를 비롯하여 보수적인 색채를 고집하는 군부 혹은 지방 호족들, 그리고 원주민과 농민들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뒤얽힌 혁명이었다. 10여 년에 걸친 기나긴 혁명 기간 동안 이 다양한 세력들은 연합하고 경쟁하며 서로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혁명기 내내 거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판초 비야(José Doroteo Arango Arámbula, 1878~1923)와 에밀리아노 사파타(Emiliano Zapata Salazar, 1879~1919)의 투쟁이었다. 이들이 리더가 되어 혁명 기간 동안 전국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원주민과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들은 멕시코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주요한 세력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혁명 이후 혁명정부를 수립한 북부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어려운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는 혁명 이전 시대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혁명 과정 속에 오만 가지로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우선 혁명정부는 외세 의존적이고, 특히 유럽에 지나치게 경도되었던 지난날의 정치ㆍ경제 체제를 극복해야만 했다. 따라서 그들에게 새로운 멕시코와 멕시코 국민들은 자주적인 어떤 것이 되어야만 했다. 또한 혁명정부는 자유주의적이면서도 중앙 집권적인 통합정책을 펼치면서, 특히 멕시코 혁명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원주민을 비롯한 인민 대중들에게도 혁명의 성과를 돌려주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것이 ‘혁명적 인디헤니스모(Indigenismo)’라는 이데올로기였다.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혁명적 원주민주의’라고나 할까? 아무튼 192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이 개념은 멕시코 내의 원주민들에 대한 관념과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혁명적 인디헤니스모를 주장하는 이들에 따르면 원주민들의 문화는 ‘정신적인 (지식) 문화’와 ‘물질적인 문화’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물질문화는 제도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했지만, 정신문화는 문자, 심미적 재능, 정교한 예술 등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마야 문명이나 아즈텍 등의 화려하고 정교한 문화유산들은 원주민들의 놀라운 정신문화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들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더 이상 배척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 원주민의 문화는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과거’이자 국민 문화의 원천이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많은 부분 원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 정비되었고, 국가에 의해서 이들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다. 이때부터 정부의 공공 기념물들은 원주민 예술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디자인되었으며, 상공부를 통해 전국의 민속예술품들을 전시하는 작업을 후원하기도 했다.2)
-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에는 물론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다. 짧게 언급했지만, 원주민의 ‘물질문화’는 인디헤니스모를 주장했던 이들에게도 결국 후진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보다 문명화되고 근대화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당시의 인디헤니스모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원주민’의 문제에는 무감각하고 ‘죽은 원주민’의 문제에만 천착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경의 <멕시코의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성격>, [서양사론], 한국서양사학회, 2004를 참고할 것을 권한다.
아즈텍의 고대도시 테노치티틀란을 그린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 <La Gran Tenochtitlan>. 원주민과 그들이 꽃피웠던 문화는 멕시코 벽화운동의 주된 소재였다.
이 가운데 특히 유명한 것이 벽화운동이다.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1886~1957),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José Clemente Orozco, 1883~1949),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David Alfaro Siqueiros, 1896~1974) 3인방은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관공서, 국립대학을 비롯한 각종 공공건물에 그들의 예술 세계를 마음껏 표현하였다. 그들이 그린 주된 벽화의 주제는 원주민과 원주민의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었다. 물론 이들의 예술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또한 이들의 벽화가 마치 전설처럼 추앙받게 된 것은 혁명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호세 바스콘셀로스의 ‘우주적 인종’
‘우주적 인종’이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메스티소를 우월한 인종이라고 주장한 호세 바스콘셀로스.
당시의 멕시코를 좀 더 살펴보자. 국민 통합의 일환으로 원주민을 긍정하는 혁명적 인디헤니스모 운동이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메스티소 인종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이 등장했다. 필자 생각에 멕시코 국민 통합 혹은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선봉장은 아마도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 1882~1959)가 아닐까 싶다. 멕시코 국립대학교 총장과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바스콘셀로스는 메스티소의 인종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이름하여 ‘우주적 인종(La Raza Cósmica)’이다. 번역자에 따라 ‘보편적 인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용어는 호세 바스콘셀로스가 1925년 동명의 제목으로 발표한 [우주적 인종]이라는 저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우주적 인종이란 바로 메스티소를 의미한다.
바스콘셀로스는 매우 신선한(?) 인종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인류는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인 홍인, 아시아의 황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인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의 인종 분류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종이 등장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인종’이 되는 메스티소다. 유럽의 백인종과 아메리카의 원주민인 홍인이 혼혈되어 앞의 모든 인종을 뛰어넘는 우월한 인종이 탄생한 것인데, 이 인종이 시간적으로는 ‘최후의 인종(Raza Final)’이며 공간적으로는 ‘우주적 인종’이라는 것이다.
바스콘셀로스의 주장에 따르자면 “새로운 시대는 모든 사람들 간에 융합이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한다. 따라서 융합의 산물인 메스티소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종이 된다. 간략하게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양성을 내재한 우주적 인종인 메스티소야말로 인종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미래를 예비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지금 그의 저서를 읽어보면 논리도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과연 그가 정신분열 증세를 겪고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이 당시 멕시코에서 설득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스콘셀로스의 주장이 당시 멕시코의 국민성을 창조해내기 위한 시대적인 요구사항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멕시코가 유럽이 되어야만 했고, 멕시코인이 백인이 되어야만 했던 것은 유럽 그리고 백인이 그 자체로 ‘근대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원주민의 문화는 그 자체로 위대하고 놀라운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비록 유럽 백인 정복자들에 의해 어두운 역사를 겪게 되었지만, 그 결과로 등장한 원주민과 백인의 혼혈인 메스티소는 새로운 미래에 적합한 인종이었던 것이다.
물론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혁명적 인디헤니스모, 그리고 우주적 인종이라는 개념은 한계가 뚜렷한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 혁명적 인디헤니스모라는 이데올로기와 그에 수반된 각종 문화운동과 정책들이 ‘살아있는 원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게다가 우주적 인종이라는 개념은 멕시코와 멕시코 인접 국가들의 메스티소 문화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바스콘셀로스의 논리는 인종 서열을 근간으로 한 인종주의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을 내포하고 있었다. 사실 우주적 인종이라는 개념을 통해 원주민을 보았을 때, 백인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백인을 메스티소로 바꾸었을 뿐, 원주민은 결국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닌가? 따라서 연구자들은 20세기 초 멕시코에서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기껏해야 ‘죽은 원주민’들을 신화화시켰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라틴아메리카 인종 혹은 종족성에 대하여
식민지 시절 멕스코의 카스타 제도에 따르면 스페인인과 원주민이 결합하여 메스티소가 태어난다. 이들 메스티소를 차별하고 배척하느냐, 긍정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각 나라의 인종 문제가 달라져 왔다.
독립 후 근대화 과정, 그리고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은 나름의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유럽 중심의 백인을 국민으로 이해했던 아르헨티나는 백인이 될 수 없었던 원주민 혹은 메스티소를 철저하게 차별하고 배척했으며, 심지어 학살하기까지 했다.
한편 또 다른 길을 선택한 예도 있다. 오늘 살펴본 멕시코의 경우에는 비록 한계가 있었을지라도, 나름 원주민의 문화를 긍정하였으며 원주민과 백인의 혼합으로 등장한 그들 고유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했다. 멕시코는 메스티소를 자신들의 국민성으로 껴안았던 것이다.
페루와 볼리비아처럼,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 그리고 우루과이처럼 거의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 브라질, 혹은 카리브해의 국가들처럼 흑인이라는 또 다른 종족성을 지닌 나라들. 이렇게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과정을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국민성을 형성했다.
가끔 인터넷 게시판에는 밑도 끝도 없이 라틴아메리카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글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전히 백인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존재하며, 메스티소 문화를 적극적으로 긍정한 역사를 지닌 멕시코 역시 사회 지도층 혹은 인기 연예인들은 보다 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 메스티소만이 우월하다는 묘한 배타주의까지 겹쳐져 멕시코의 인종 혹은 종족 차별의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3)
- 아마도 인종차별이 없다면 관광객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에 특히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묘한 이야기들이 떠도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마치 고려시대 향ㆍ소ㆍ부곡처럼 브라질의 빈민가에는 소외계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메스티소나 물라토들이다.
지금까지 세 편의 글을 통해 아주 간략하게 라틴아메리카의 인종 혹은 종족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인종 혹은 종족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유효하다. 비록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위치한 라틴아메리카의 이야기를 다뤘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인종 혹은 종족성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우리는 왜 아시아 사람들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유럽 혹은 미국인들을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여기는가? 왜 우리는 턱을 깎고 코를 높여 서구적인 마스크를 가져야만 할까? 이러한 모든 고민들은 현재도 유효한 것이며, 지구 반대쪽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 참고문헌
- 박구병,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유럽 인식과 자기정체성 탐색–볼리바르에서 바스콘셀로스까지>, [서양사론], Vol. 91, 2006.
- 김윤경, <멕시코의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성격>, [서양사론], 한국서양사학회, 2004.
- 안태환, <호세바스콘셀로스의 ‘우주적 인종’과 ‘문화적 국민주의’의 비판적 접근>, [코기토], Vol. 69, 2011.
- 김세건, <메스티소와 원주민 사이에서 - 멕시코 국민주의와 원주민 종족성>, 김광억 외, [종족과 민족], 아카넷, 2005.
- 임상래 외, [라틴아메리카의 어제와 오늘], 이담북스, 2011.
- 카를로스 푸엔테스, 서성철 역,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까치, 1997.
- 박종욱, [라틴아메리카 종교와 문화], 이담북스, 2013.
- 박구병 외, [제3세계 역사와 문화], 방송대출판부, 2007.
- Richard Graham ed., [The Idea of Race in Latin America, 1870-1940], 1990.
- Peter Wade, [Race and Sex in Latin America], Pluto Press, 2009.
- Rachel Sieder ed., [Multiculturalism in Latin America: Indigenous Rights, Diversity and Democracy], Palgrave Macmillan, 2002.
- Raúl L. Madrid, [The Rise of Ethnic Politics in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Van Teun A. Dijk, Neyla Graciela Pardo Abril, Marta Casaús Arzú and Carlos Belvedere, [Racism and Discourse in Latin America (Perspectives on a Multiracial America)], Lexington Books, 2009.
- Joane Nagel, <Ethnicity and Sexuality Ethnicity and Sexu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6, (2000), pp. 107-133
- 글
- 김유석 | 역사 저술가
- 글쓴이 김유석은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역사관을 바로 잡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쓰기로 표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1960년대 미국 서남부 치카노 운동의 성격: '친쿠바 혁명주의자'들의 영향을 중심으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빅이슈에 [국기로 보는 세계사]를 연재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Q&A세계사: 이것만은 알고 죽자](공저, 2010)와 [생각의 탄생: 19세기 자본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주석
1
위트있게도,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상류층은 돈 쓰는 방법, 의복, 생활양식, 건축양식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애호, 그리고 사회 정치ㆍ경제적 개념의 유행까지 유럽의 감각을 모방했다. 그들이 모방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유럽의 생산수단뿐이었다.”
2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에는 물론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다. 짧게 언급했지만, 원주민의 ‘물질문화’는 인디헤니스모를 주장했던 이들에게도 결국 후진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보다 문명화되고 근대화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당시의 인디헤니스모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원주민’의 문제에는 무감각하고 ‘죽은 원주민’의 문제에만 천착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경의 <멕시코의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성격>, [서양사론], 한국서양사학회, 2004를 참고할 것을 권한다.
3
아마도 인종차별이 없다면 관광객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에 특히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묘한 이야기들이 떠도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마치 고려시대 향ㆍ소ㆍ부곡처럼 브라질의 빈민가에는 소외계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메스티소나 물라토들이다.
- 이전글카페와 돈 - 카페, 영국 경제를 움직이다 16.02.06
- 다음글해상보험의 발달 - 샤일록은 왜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었을까? 16.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