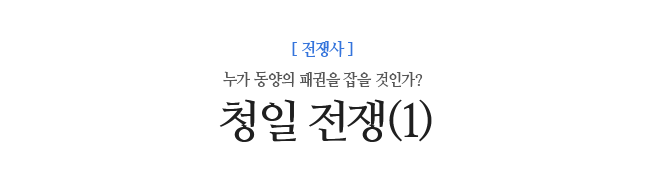전쟁과역사 청일 전쟁(1) - 누가 동양의 패권을 잡을 것인가?
페이지 정보

본문
목차
1.청일 전쟁(1) | 2.청일 전쟁(2) |
3.청일 전쟁(3) | 4.청일 전쟁(4) |
 |
19세기가 저물어 가던 무렵, 동아시아의 질서를 뒤흔드는 전쟁이 일어났다. 청일 전쟁은 공화국으로 바뀐 중국과 일본 사이에 1937년부터 치러진 중일 전쟁과 연결짓는 뜻에서 ‘제1차 중일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제2차’와 달리 청일 전쟁은 한반도가 주요 전장의 하나였으며, 동학군은 전쟁의 도화선이 된 동시에 주요 교전단체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 전쟁은 약 3백 년 전 벌어졌던 ‘조일 전쟁’, 임진왜란과 닮아 있었다. 비록 이 전쟁에서는 제2의 이순신이나 조선 관군의 활약을 찾아볼 수 없었고, 메이지 일본은 히데요시의 일본보다 전면적이고 결사적이었던 반면 청은 명에 비해 어설프고 지리멸렬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달리, 청일 전쟁은 서구 열강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 그들은 이 전쟁을 “과거와 현재의 전쟁이자, 서양 문명과 낡은 동양 문명의 전쟁”(제노네 볼피첼리)이라고 불렀다. 같은 동양이지만 서구 문물을 착실히 학습한 나라와 낡은 전통에 집착한 나라의 우열이 이로써 판가름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차차 깨닫게 된다. 이 전쟁은 그처럼 세련된 문명의 껍질 속에 감춰진, 아니 그런 문명에 의해 한껏 부추겨진 야만을 인류 역사에 선보인 사례이기도 했음을.
한 발 앞서 있던 중국
“낡은 동양 대 서양”이라지만, 서구적 근대화의 필요성을 더 일찍 인식하고 실천에 옮긴 쪽은 중국이었다. 1840년의 아편 전쟁과 1857년의 제2차 아편 전쟁(애로 호 전쟁)으로 천조(天朝)의 자존심에 직격탄을 얻어맞은 청왕조는 1851년 이후 태평천국의 난까지 발생하자 ‘이러다가는 왕조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861년, 베이징 조약(1860)으로 제2차 아편 전쟁이 끝난 직후 벌어진 ‘신유정변’에서 어린 동치제를 내세우며 권력을 장악한 서태후(자희태후)와 공친왕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의 구호 아래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한다.
이를 ‘양무운동(洋務運動)’이라 했으며, 1861년 서구식 행정 및 외교를 담당할 총리기무아문 설치, 1863년 서양식 기기를 제작할 강남제조총국과 금릉기기국 설치, 1866년 서구 학문을 배울 동문관 분관과 증기선을 건조할 선정국 설치 등 비교적 빠르고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1869년에는 중국 최초로 1000톤 급의 서양식 함선이 건조되고, 1871년에는 자체 기술로 증기기관을 개발했다. 여기에 1864년에 태평천국의 난도 진압되고 서양 열강과의 외교도 정상화되면서, 1870년대 초까지는 ‘동치중흥’이라 부를 만한 안정과 발전의 모습이 두드러지는 듯했다.
그 사이에 일본은 서구화에 강력히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도쿠가와 막부체제의 오랜 평화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내홍을 겪고 있었다. 미국의 군함이 도쿄 만에 입항해 위세를 부린 결과 맥없이 개항에 동의해 버린 막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일왕의 궁성에서부터 여러 번(藩)의 유학자나 낭인들에 이르기까지 터져나왔다. 이는 조슈나 사츠마 같은 번들의 이반과 개항 찬성자, 막부 관련자들에 대한 연쇄 암살로 이어졌다. 중국에서 기기국을 세워 서양식 대포와 증기선을 만들어내던 시점에, 일본에서는 양이(攘夷)를 외치는 사무라이들이 교토의 길거리에서 칼부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반막부파가 결집하여 왕정복고가 이루어지자, 막부체제를 옹호하는 세력과 신정부세력 사이에 보신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나 1870년대 들어 흐름은 바뀌기 시작했다. 관료주의, 치욕에 대한 망각, 그리고 만주족과 한족 사이의 알력 등등으로 청나라의 발전은 둔화된 반면, 본래 존왕양이를 내세우며 권력을 잡은 메이지 유신지사들은 적극적인 서구화를 추진해 나갔다. 처음부터 중체서용의 일본판인 ‘화혼양재(和魂洋才)’식 사고방식을 가졌던 데다, 보신 전쟁에서 대포와 소총 앞에 사무라이의 칼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실감하고, 해외 유학과 시찰을 통해 서구의 체제가 부국강병의 열쇠라는 생각에 눈떴기 때문이었다. 메이지 유신은 또 군국주의로도 빠르게 연결되었다. ‘폐번치현’과 ‘폐도령’으로 구체제를 혁신하고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반발과 적대감에 대처하기 위해서나, 승화시키기 위해서나, 정부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해외 침략을 벌이는 일이 최선이라 여겨진 것이다. 이는 1872년의 징병제 실시, 1874년의 모란사 출병, 1876년의 운요호 사건으로 착착 현실화되었다.
모란사(牡丹社)는 대만의 한 지역이었는데, 1871년에 류큐 미야코지마의 어민들이 이곳에 표착했다가 현지인들에게 살해되고, 류큐의 종주권을 주장해온 일본은 청나라에 강력 항의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청이 거부하자 결국 1874년에 3600명의 일본군이 대만에 건너가, 모란사를 제압했다. 이에 마지못해 회담장에 나온 청은 50만 냥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분쟁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일본은 또 2년 뒤 운요호를 강화도에 보내 조선 수비대의 공격을 유도하고는 그것을 빌미로 앞선 화력을 마음껏 과시한 다음, 조선을 회담장으로 끌어내 오랜 쇄국을 마감하고 개항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청과 일본의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청은 류큐 문제로 배상금을 지불한 것이나,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것이나 그리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류큐는 스스로 ‘교화권외’ 지역으로 여겨왔으므로 비교적 소액으로 일본과의 괜한 불화를 무마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여겼고, 조선 역시 명목적인 종주권만 유지해 왔으므로 일본과 종래의 ‘교린’을 재개하는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서구적-근대적인 국제법 체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던 일본은 여기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류큐인의 살해에 청국이 배상을 한 것이나, 강화도 조약 제1관에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라고 명시한 것은 이들이 모두 청국의 종주권에서 탈피했음을, 특히 류큐의 경우에는 일본의 영토권이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여긴 것이다(그리하여 1879년, 류큐를 오키나와 현으로 선언한다). 이런 시각 차이는 차차 표면화되며 양국의 불화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1880년대로 넘어가면, 그런 불화는 수습이 어려울 지경까지 격화된다. 그 계기는 다름아닌 조선에서 비롯되었다.
‘은둔의 왕국’에서 ‘동방의 화약고’로
근대화 초기 과정에서 동양 3국은 제각기 극심한 내부적 갈등을 해결해야 했다. 일본의 경우는 막부파와 유신파, 청나라는 만주족과 한족의 대립이 있었다면 조선의 경우에는 모든 정치변동의 중심에 고종과 대원군 부자의 권력다툼이 있었다. 두 사람은 최대의 정적이면서도 하늘이 맺어준 부자지간이었기에, 공식적인 정치 과정에서 우열을 가릴 수도, 아예 노골적인 전면전으로 승패를 정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고종은 왕비인 명성왕후의 일족이나 개화파를 등용하며 아버지를 견제했고, 대원군은 때로는 청에, 때로는 일본에 붙으며 집요하게 아들의 권력을 빼앗으려 했다.
일본의 개항이 집권세력인 막부파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듯, 조선의 개항도 위정척사를 부르짖는 대다수의 사대부들이 고종의 조정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계속해서 고종이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1880년) 별기군을 창설하는(1881년) 등 ‘동도서기(東道西器)’적 개화 조치를 이어가자, 쌓이던 불만은 1882년의 임오군란으로 터져나왔다. 별기군에 비교된 차별 대우를 견디다 못한 구식 군인들이 대원군을 업고 군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들은 민씨 척족, 개화파, 일본인들의 목숨을 노렸으며, 궁궐을 장악한 대원군은 고종을 허수아비로 앉히고 그동안의 개혁 조치를 모조리 취소했다.
자국 공사가 직접 습격당해 허겁지겁 피신해야 했던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했지만, 먼저 손을 쓴 쪽은 청나라였다. 몇 년 전만 해도 주변국에서의 일에 둔감했던 청은 일본이 조선과 대만을 노릴 뿐 아니라 러시아는 북쪽에서, 프랑스는 남쪽에서 호시탐탐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특히 조선에 대해서는 1879년, 최고 실력자 이홍장(李鴻章)이 ‘조선을 빼앗기면 안보가 뿌리부터 흔들린다’며 명목적 종주권에 만족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조선을 확실히 종속시켜야 한다, 번국(藩國)이 아니라 일종의 식민지로 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래서 임오군란의 소식을 듣기가 바쁘게 병력을 파견해 대원군을 납치, 북경으로 잡아간 다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맺어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시하고 청의 상인들과 병력이 조선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선수를 빼앗긴 일본은 격앙되었다. 일본 개화사상가의 대부 격이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청과 전쟁을 벌여 조선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경한 주장을 쏟아냈으며, 육군경으로서 일본 군국주의화의 주축이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청을 가상 적국으로 삼는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을 추진했다. 1883년 이후 국방비가 일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의 두 배에 가까운 25퍼센트 이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청은 대국이었고, 정면 대결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력을 쓰지 않고도 한반도에서 일본의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는데, 하나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조선을 영세중립국화하는 방안, 다른 하나는 조선이 자체적으로 개화 및 친일 노선을 걷도록 돕는 방안이었다. 이 중 두 번째가 현실로 옮겨진 것이 1884년의 갑신정변이었다. 김옥균 등의 급진개화파가 추진한 쿠데타는 다소 지나치게 모험적이었으나, 일본은 다케조에 신이치로 공사를 앞세워 암암리에 정변을 도왔다. 마침 청나라는 베트남의 지배권을 놓고 프랑스와의 전쟁에 들어가 있었기에, 조선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리라는 기대가 그런 모험을 부추겼다.
싸울 것인가, 동맹을 맺을 것인가
하지만 청나라의 원세개(袁世凱)의 빠른 개입으로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났으며, 김옥균 등은 일본에 망명했다. 일본은 조선에서 청이 한 발짝 앞서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듬해 ‘조선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킨다. 조선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교관을 보내지 않는다. 변란 등의 일로 어느 한 쪽이 파병할 경우, 상대방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진 조약을 청과 맺었다.
청의 이홍장은 북양함대, 남양함대, 복건함대를 창설하고 독일에 7천톤급의, 당시로서는 괴물 수준이던 초대형 장갑 군함 정원(定遠), 진원(鎭遠)과 쾌속함 제원(濟遠)을 구입함으로써, 최대 톤수가 3천톤급이던 당시의 일본 해군을 양적으로는 압도했다. 다시 1887년에는 치원(致遠), 정원(靖遠), 경원(經遠), 내원(內遠)을 더 구입했고, 1891년에는 러시아 니콜라이 황태자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축하를 핑계로 정원과 진원을 도쿄 앞바다로 보내 위력을 한껏 과시했다. 실제로 발에 땀띠가 날 정도로 자체 해군력을 증강한 뒤에도 일본인들이 정원, 진원에 대해 품었던 공포감은 수그러들지 않아, 훗날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황해 바닷길을 한동안 회피할 정도였다.
청나라가 자랑하던 초대형 중장갑 전함, 정원호
북양함대에 대한 공포를 일축했던 사람도 있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다. 그는 “청나라는 아직도 무과(武科)에서 활솜씨로 장교를 뽑고 있는 나라다! 양무운동이니 뭐니 하지만 아직 중국의 잠은 깨지 않았다.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 잘못 움직였다가는 그 잠을 완전히 깨울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이토였다. ‘완전히 깨어난 중국’은 역시 두려운 상대였던 것이다. 더욱이 노골적으로 남하 정책을 펴고 있던 러시아, 그 러시아를 경계하면서 청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하려 하던 영국의 존재가 있었다.
영국은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 침입하는 한편 함경도의 영흥을 탈취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자 1885년 초에 거문도를 점령하고 요새를 수축했다. 청은 이를 추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러시아의 남하는 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조선이 청을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같은 해에, 청은 고종이 가장 꺼리던 대원군을 돌려보냈다. 그뿐 아니라 그 호송 책임자라 하면서 사실상의 ‘감국(監國)’으로 원세개를 딸려 보냈다.
그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훗날의 이토 히로부미 통감처럼 조선 내정에 일일이 간섭했으며, 고종을 폐위하고 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기는 방안을 일부 조선 대신들과 모의하기까지 했다. 이제 청나라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일본에게 붙는다? 갑신정변의 배후였던데다 지금도 김옥균 등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결국 러시아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조선 조정에서 힘을 얻어갔다.
영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일본은 영국과 청이 손잡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조선은 친러로 돌아설 조짐이고, 러시아의 남하는 일본으로서도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청을 주적으로 놓은 지금의 군비태세가 옳은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청과 화해하거나, 아예 동맹을 맺고 러시아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왔다. 전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는 일찍부터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해왔고,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일, 청, 영, 독이 공동 보장하는 중립화론을 내놓았다.
아오키 슈조 외무대신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청과 동맹을 맺고 함께 러시아를 공격하자. 전리품으로 청은 서부 시베리아를, 우리는 만주, 조선과 캄차카를 차지하는 것이다’라는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다. 청나라 쪽에도 일본과의 제휴를 모색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는데, 가령 주일공사를 지낸 여서창이 그랬다. 하지만 그는 ‘일본이 조선에서 손을 떼고, 청은 류큐를 포기한다’는 매우 소극적인 방식의 제휴안을 갖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청나라 고위인사들은 일본과 손잡는 일을 내켜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성되고 나면 러시아의 위협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러시아가 이 멀리까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해놓아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했다. 그리고 얼마 뒤, 1894년 4월(음력 3월),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단숨에 잠재울 바람이 조선의 남녘에서 불어왔다. 전봉준이 동학도를 이끌고 무장 봉기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도널드 킨, [메이지 천황](다락원, 2002)
- 마리우스 잰슨, [현대일본을 찾아서](이산, 2006)
- 제노베 볼피첼리, [구한말 러시아 외교관의 눈으로 본 청일 전쟁](살림, 2009)
- 메리 V. 팅글리 로렌스/제임스 앨런, [미 외교관 부인이 만난 명성황후, 영국 선원 앨런의 청일전쟁 비망록](살림, 2011)
- 천순천, [청일전쟁](세경, 2012)
- 藤村道生, [日淸戰爭: 東アジア近代史の轉換点](岩波書店, 2007)
- 나카츠라 아키라,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푸른역사, 2002)
- 아사오 나오히로 외, [새로 쓴 일본사](창작과비평사, 2003)
- 아사히신문 취재반, [동아시아를 만든 열 가지 사건](창비, 2008)
- 이인직, [혈의 누](문학과지성사, 2007)
- 이승만, [청일전기](북앤피플, 2015)
- 강성학,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리북, 2006)
- 권무혁, “청일전쟁 시기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중국연구」 통권 109호, 2006)
- 김영근, 조명철 편, [일본의 전쟁과 평화](인터북스, 2014)
- 김용구, [세계외교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12)
- 김주삼, “청일전쟁과 일본의 삼국간섭국가들에 대한 외교전략 분석”(「한국동북아논총」 제53집, 2009)
- 왕현종 외,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동북아역사재단, 2009)
- 조명철, “청일전쟁기, 열강과 일본의 중국침탈”(「일본연구」 제13집, 2010)
- 차경애, “청일전쟁 당시 조선 전쟁터의 실상”(「한국문화연구」 14, 2008)
- 최기성, [동학농민혁명운동 연구](서경문화사, 2006)
- 허홍범 외, [세계를 움직인 해전의 역사](지성사, 2008)
- 글
- 함규진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역사저술가
- 글쓴이 함규진은 여러 방면의 지적 흐름에 관심이 많다. 정치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한편, 주로 역사와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썼고, 인물이나 사상에 대한 번역서도 많이 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보수와 진보 등 서로 대립되는 듯한 입장 사이에 길을 내고 함께 살아갈 집을 짓는 것이 꿈이다.
저자의 책 보러가기
|
인물정보 더보기
- 이전글청일 전쟁(2) - 한반도, 300년 만에 중-일의 전쟁터가 되다 16.02.07
- 다음글1941년 모스크바 전투 [6] - 히틀러의 야욕이 좌절되다 16.02.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