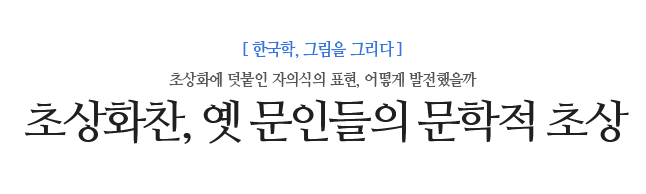테마로보는역사 초상화찬 - 자화상에 덧붙인 자의식의 표현
페이지 정보

본문
과도한 개성의 분출이 억제되고 서구에 비해 자화상이 발달하지 않은 전통시대의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옛 문인들의 ‘문학적 자화상’은 어떤 표정과 포즈를 취하고 있을까? 흔히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고 하지만, 한 인간의 존재 및 개성을 일상적으로 표현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 내면보다 한 걸음 먼저 다가오는 것은 외모에서 풍기는 첫인상이다. 인간의 외형보다 정신적인 면과 내적 수양을 중시했던 조선 사대부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조선 문인들은 초상화의 근원적인 가치에 대해 회의하고 초상을 중시하는 시속의 경향에 경계심을 표하면서 자신의 초상 제작을 조심스러워하는 산문이라든지, 주변의 간청 때문에 마지못해 초상을 마련했다는 소극적인 뉘앙스의 일화들을 종종 남기곤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초상화에 부쳐 쓰는 글쓰기 양식인 ‘초상화찬(贊)’의 전통을 20세기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초상 이미지를 출발점 삼아 ‘나’와 인간에 대해 설명하는 문학적 장(場)을 마련하였다.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 같은 추상적ㆍ정신적 문제가 사상과 담론의 주류를 이루었던 조선시대에, 외모나 복식 같은 구체적 시각 이미지와 연관된 자의식의 표현은 어떤 빛깔을 보이고 있었는지 그 샛길로 잠깐 들어서보는 것도 일견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이다.
내가 보는 나, 초상자찬
한ㆍ중ㆍ일을 아우르는 동아시아의 옛 전통에서는 관료나 문인 지식인 같은 상류계층 인사들이 초상화를 제작하고 그 초상화에 대한 글을 한문으로 짓는 문화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한문 문학 장르인 ‘초상화찬(贊)’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타인의 초상화에 부쳐 쓰는 ‘찬(贊)’이고, 다른 하나는 초상의 주인공이 자기 초상에 대해 짓는 글인 ‘자찬(自贊)’이다. 초상화찬은 형식상 한시와는 다르지만, 산문보다 운문에 가깝고 창작 시 각 행의 글자 수와 운율을 고려하는 짧은 형태의 시적(詩的) 기술이다.
그림 1 <이덕수 초상>
비단에 채색, 51.2×39.5cm, 일본 천리대 소장.
초상화찬은 초상에 그려진 인물의 외모 이미지를 글쓰기의 출발점이자 중심 소재로서 활용하는 글이다.예컨대 다음에 살펴볼 이덕수(李德壽, 1673~1744) 자찬의 경우에는 눈 모양, 높이 솟은 귀, 긴 수염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성품과 내면적 지향을 드러냈다.
한쪽 눈은 위엄 있고 한쪽 눈은 자애로우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귀는 높이 솟았으니 아마도 도를 들은 바가 높아서 낮지 않은 것인가. 수염은 기니 아마도 뒤에 덮인 바가 길어서 촉박하지 않은 것인가.
一眼威 一眼慈 有殺有活 耳之聳 豈所聞之道 高而匪卑 髥之脩 庶所蔭于後 遙而不促 (……)
이덕수, <초상화에 대한 찬(畫像贊)>
특히 한쪽 눈은 위엄 있고 한쪽 눈은 자애로워 보인다는 서술은 작가 자신의 두 가지 면모를 흥미롭게 표현한다. 남아 있는 이덕수 초상(그림 1)과 함께 놓고 보면, 미묘하게 다른 양쪽 눈의 표정, 가슴을 덮고 있는 풍성하고 긴 수염이 자찬의 외모 수사(修辭)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독특한 인상을 준다. 구체화된 신체 형상이 각 부위별로 내면과 긴밀하게 교직되어 상응하면서, 덕의 표상과도 같은 추상화ㆍ미화된 전형적 외모 이미지를 나열하는 것보다 생동감 있는 글이 되었다. 이처럼 초상화찬에서 구체적으로 재현된 외모나 표정은 초상 주인공의 내면 독해를 가능케 하는 외현적 텍스트이자, 내적 지향에 관한 서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시각적 단초로서 기능한다.
그렇다면 초상화 속 주인공의 외모나 복식 같은 화면 내의 요소들은 늘 초상화찬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 내지 상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슴을 벗삼고, 초가 오두막을 집으로 삼고 싶다. 창문 환하고 인적 고요할 제 주림을 참고 책을 보네. 네 모습은 파리하게 여위고 네 학문은 공소하다. 하늘의 마음을 너는 저버렸고 성현의 말씀을 너는 업신여겼으니 마땅히 너를 두어야 하리, 좀벌레의 무리 속에.
麋鹿之羣 蓬蓽之廬 窓明人靜 忍飢看書 爾形枯臞 爾學空疎 帝衷爾負 聖言爾侮 宜爾置之 蠧魚之伍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초상을 보며 나 자신을 경계하다(書畫像自警)>
송시열은 위 자찬에서 자신의 외모를 여윈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송시열의 초상화들(그림2)을 보면 그가 결코 파리하게 마른 외모는 아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우람한 풍채는 초상의 관람자를 위압할 만큼 당당하고 강인한 인상을 준다. 이는 현전하는 다수의 송시열 초상화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그의 외모 특징이기도 하다. 사실 송시열의 초상화에 찬을 썼던 후대인들은 “태산교악(泰山喬嶽)”, “우뚝한 산악의 기상(嶷嶷山嶽之氣像)”이라든지 “우뚝하여 위엄 있는 모습(巖巖像)”과 같은 표현들을 빈번하게 쓰고 있으며, 이 경우 ‘높이 솟은 산’이란 송시열의 위풍당당한 외모까지 포함시켜서 인물의 인품과 기상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이미지였다. 이런 사례들은 송시열이 자찬에서 스스로 “여윈” 모습을 앞세우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타인에 대한 칭송이 주를 이루는 정격 초상화찬이라면 송시열의 장대한 풍채 역시 긍정적으로 의미화되고 활용되기에 적절한 요소였지만, 냉철한 자기반성에 바탕을 두고 수기적 의지를 다잡는 자찬에서는 산 속의 조용한 거처에서 학문에 몰두하는 파리한 선비의 모습이 글의 주제와 보다 어울리는 이미지였다. 기실 송시열의 사례를 비롯한 초상자찬의 전통에서는 타인에 대한 초상화찬의 경우와 달리 관직의 고하에 상관없이 마르고 수척한 외모, 즉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먼 청빈하고 초탈한 선비 혹은 은자, 때로는 병약한 문인의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옛 사대부들이 선호했던 자아 이미지의 윤곽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해준다.
보잘것없는 너의 형체와 정신은 산야(山野)에 파묻혀야 마땅한데 의젓한 너의 관과 띠 도리어 조정의 귀한 신하네. 발은 뒷걸음질 치는(사양하거나 주저하는 모습) 듯하고 눈썹은 찡그린 듯.
藐爾形神 宜乎山野之沉淪 儼爾冠紳 却是巖廊之貴臣 足若逡巡 眉若蹙顰 (……)
서명응(徐命膺, 1716~1787), <60세 초상에 스스로 쓰다(自題六十歲眞)>
위 자찬에서는 마땅한 제자리인 산야에 찾아가지 못하고 “조정의 귀한 신하”로 머무르고 있는 처지가 스스로 편치 않아 머뭇거리고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포즈와 어딘지 못마땅해하는 표정으로 자기 초상 이미지를 독해하고 있다. 서명응의 초상에 그런 찡그린 표정과 불안정한 발의 위치가 실제로 그려져 있지는 않았을 듯하다. 초상자찬 속의 이런 수사(修辭)는 실제 초상화의 도상과 부합한다기보다는 초상화 이미지가 초상 주인공과 당대의 초상 관람자들, 더 나아가 초상화찬의 독자들에게 독해되었던 문화적 코드를 알려주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이 코드를 읽어내기 위해 유사한 자찬의 예를 하나 더 보자.
네 모습은 어찌 파리하며, 네 거동은 어찌 서투른가. 밝은 그 눈동자, 꼿꼿한 그 기골. 푸성귀 먹고 물 마시는 자연 속 은자의 관상이요, 붉은 관복에 금띠 두른 재상의 모양이로다.
爾貌何瘦 爾儀何拙 瞭然其目 骯然其骨 飯蔬飮水 山野之相 服緋拖金 宰相之
(……)
조관빈(趙觀彬, 1691~1757), <초상자찬(畵像自贊)>
과연 초상 주인공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이 “자연에 사는 은자의 관상”임을 바로 판별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은 대상에 대한 객관적 재현이라기보다는 대상을 주체가 원하는 특정 방향으로 보고자 하는 주관적ㆍ심리적 경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위 자찬은 청빈한 “은거자의 관상”과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은 “재상의 외양”이란 두 이미지를 콜라주(collage)해 붙인 듯 부조화스럽게 병치해 놓았다. 노론계 고위관료로 정쟁의 한복판에서 일생을 보냈던 조관빈이지만, 자찬 속에서는 재상의 위의(威儀)에 걸맞지 않게 파리하고 매사에 서투른 듯한 자아상을 그려 보였다.
이처럼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진 자신의 초상화를 보면서, 오히려 복식과는 정반대로 자연에 사는 은사(隱士)로서의 자아를 그리고 읽어내는 자찬을 쓰는 일은 초상자찬 창작의 전통 내에서 한 유행을 이루었다. 현실적으로는 관료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연과 은거를 그리는 동양 고전문학(각종 한시, 한문산문 및 국문시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남)의 오랜 테마가 초상화의 도상적 양식 및 초상화찬이란 문학 장르와 만나면 이런 식의 자찬 내용 유형으로 변주되어 나타났다. 글의 내용만 놓고 보면 다분히 관습적인 주제이고 전형적인 사대부 의식의 반영이라 하겠지만, 그런 상투적인 주제를 전달하는 표현적 측면에서 보면 관복을 입고 있는 초상화 속 자기 모습을 자찬의 내용 전개에 십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취향과 지향을 역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흥미롭다. 고위관료로서의 삶을 살았던 초상의 주인공이 자기 관복본 초상의 뒷면을 스스로 들추어, 자연 속의 삶을 꿈꾸었건만 끝내 이루지 못한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을 내보이고 변명하는 것이다.
자찬의 이런 내용은 초상화 제작시의 복식 선택 문제와 연계시켜 이해해야 한다. 옛 사대부들은 자신의 초상을 제작할 때 정장 관복[사모·관대 차림, 일명 관복본(官服本) 초상]과 선비의 일상복[심의ㆍ도포에 복건ㆍ정자관 등의 차림, 일명 야복본(野服本) 초상] 차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복식 선택을 통하여 화가의 손으로 그려지는 초상에 자신의 취향을 일정 정도 반영시킬 수 있었다(상대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복식을 달리하여 여러 벌의 초상을 주문하는 방법도 있었다). 야복본 초상은 검박하고 고고한 학자적 면모를 강조할 수 있기에 관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조선 후기에 유행ㆍ애호되었다. 한편 관복본 초상은 흉배 무늬와 띠의 종류를 포함한 복식 형태만으로도 초상 속 인물의 관직과 품계가 한눈에 드러났는데, 초상 주인공의 사후 초상의 주된 관람자가 될 그 자손 및 후대인들에게 관료로서의 사회적 성공의 증표를 효과적으로 현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후자의 이유로 관복본 초상을 포기하지 못한 일부 고위관료들은 서명응이나 조관빈처럼 자찬상(自贊上)으로나마 야인적 이미지에의 지향을 대리충족하면서 야복본 초상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친구가 보는 나, 지인의 초상에 대한 초상화찬
크게 벌린 건 입이려니 벗어진 건 이마려니 말 잘하는 건 그림으로는 못 그리지.
哆然者口耶
然者顙耶 高雄辯 丹靑莫狀
박태순(朴泰淳, 1653~1704), <조장경의 초상에 장난삼아 쓰다(戱題趙長卿畵像贊)>
마치 오늘날 개인 홈페이지 사진첩에 남긴 친한 친구의 장난기 어린 댓글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 작품에서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현실적이고도 희화화된 외모는 초상화찬 장르의 흐름에서 매우 보기 드문 장면이다. 타인의 초상화에 찬을 쓸 때는 대상 인물에 대한 찬양과 미화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덕 있는 외모”,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 “바다 같은 마음”, “봄바람처럼 온화한 기운” 등의 관습적ㆍ전형적 표현들이 동원되는 것이 상례다. 하지만 위 작품에서 “크게 벌어진 건 입”이라든지 “벗어진 건 이마”라는 서술들에는 대상 인물의 외모를 통해 내면의 고상함과 비범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오히려 친구의 장난기 어린 시선은 보는 이의 웃음을 살 법한 외형적 요소들만 골라서 포착하고 있다. 인간의 외모를 내면적 요소와 연계, 혹은 교차시키면서 심대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초상화찬의 일반적인 서술 경향을 뒤엎으면서, 장르 관습과 전형적 수사 뒤에 숨겨진 현실 속 인간의 모습을 호출해냈다.
위 작품의 후반부 문구는 초상화가 인물의 외모는 그려내지만, 그 정신과 기상, 진면목은 그리지 못한다는 초상화찬 장르의 상투적 종결부 언술(당(唐) 배도(裵度) <자제사진찬(自題寫眞贊)>에서의, “한 조각 마음을 초상으로는 못 그리네(一片靈臺 丹靑莫狀)” 같은 구절을 떠올려볼 수 있다)을 해학적으로 비틀어 쓴 것이다. 초상화로 외모는 그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말 잘하는 건 그릴 방도가 없다는 표현으로 기존의 전형적 언술을 교묘하게 활용하면서 재미를 주는 동시에, 평소 앞에 나서서 목소리 높여 말하기 좋아하는 친구의 언행과 성격의 한 단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그림 3 강세황(姜世晃), <연객 허필상(煙客 許佖像)>
종이에 채색, 31.7×18cm, 개인 소장. <출처: 네이버 미술검색>
문인화가 강세황이 그린 친구 허필의 초상이다.
작품 보러가기
조선 후기에는 가까운 지인의 초상에 대해 농담조의 담론을 주고받는 사례가 종종 보이며 그런 성격의 초상화찬 역시 늘어난다. 조구명(趙龜命, 1693~1737)은 <성보 형의 초상에 부친 찬(成甫兄畵像贊)>에서 초상의 주인공 성보가 사방에 널려 있는 학(鶴)과 워낙 똑같이 생겨서 딱히 초상을 만들 필요도 없다든지, 성보가 “진짜 학”으로 오인되어 사로잡히고 새장에 갇히는 고역을 겪을까 염려된다며 짐짓 기롱(譏弄: 실없는 말로 놀림)하고 있다. 한 마리 학처럼 고고한 친구의 인격에 대한 칭찬의 말과 ‘영락없이 학처럼 생겼다’는 식의 외모에 대한 놀림이 행간에서 묘하게 교차되고 있다. 조영석(趙榮祏, 1686~1761)은 친분 있는 화가 정선(鄭敾, 1676~1759)이 그린 친구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의 초상에 찬을 지으면서, 초상 속의 사람이 항상 똑같은 복장을 하고 “비 오나 바람 부나 추우나 더우나” 여기 앉아 있기만 하는데, 불자(佛者)인지 도사인지 아니면 평범한 노인네인지 아무리 봐도 도통 알 수 없다고 썼다. 이 대목에서 의연하게 정좌해 있는 초상 속 인물은, 어떤 상황에서든 짐짓 진지해 보이는 얼굴로 화폭 안에 붙박인 채 부동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그를 잘 아는 친구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놀림감’으로 전락한다. 마치 “사진이 너 같지 않게 잘 나왔네”, “왜 (사진 속에선) 평소 같지 않게 얌전하게 하고 있어?” 등 친구들 간의 떠들썩한 놀림과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초상화 혹은 사진을 매개로 상대에게 농을 거는 유머러스한 방식은, 친한 이들끼리의 특권이자 서로 격의 없는 친분을 재확인하는 한 방편이다.
조선 후기에 가까운 문인들끼리 가볍고 발랄한 분위기의 위트 있는 농담과 서로간의 우정을 담은 초상화찬을 써주고, 친구의 초상을 간소하게나마 직접 그리기도 하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은 옛 초상화 문화사에서 작은 균열이지만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그림3) 이것은 본디 초상 주인공의 사후 사당에 배향되어 제의적 용도를 띠게 되고 그 자손과 제자, 후대인들에게 존숭되었던 공적 이미지로서의 초상화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들 간의 사적 교유의 장으로 옮겨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상이 갖는 제단화로서의 첨배(瞻拜: 조상의 묘소나 사당에 우러러 절함) 용도에 걸맞게 숙엄하고 경직된 어조와 천편일률화된 칭송으로 일관하던 초상화찬은, 이제 오랜 지기로서의 남다른 정회라든가, 서로에게 실없이 빈정거려도 문제될 것이 없는 실제 교유상의 일상적인 감각까지 포용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글쓰기로 거듭났다.
초상화, 초상자찬, 초상사진―자기 표상을 통한 전통과 근대의 시각적 조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는 종래 초상화찬 창작의 전통 속에 새로이 유입된 신식(新式) 사진 촬영 문화가 자연스럽게 침투되는 문화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서구 근대가 소개한 신문물을 동양 전래의 익숙한 개념틀에 넣어 이해하고 수용하는 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사회ㆍ정치적 격변기일 뿐만 아니라, 시각 문화 및 시각 체험에 있어서의 격변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초상화 제작 시 사진을 참조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사실감을 추구하거나, 아예 사진 자체가 초상화를 대체하기도 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사진술과 서양화법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초상의 화풍에 큰 변혁이 일어났으며 종래의 초상화와 초상 사진이 병존하게 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전통적 문학 장르인 초상화찬이 한편에서는 계속 창작되고 있었다.
그림 4 김규진(金圭鎭) 찍음, <황현 사진>
1909년, 15.0×10.0cm, 개인 소장, 보물 제1494호.
사진 외곽의 종이 액자 위에 적힌 황현(黃玹, 1855~1910) 자찬(그림4), 사진 뒷면에 적힌 이건승(李健昇, 1858~1924) 자찬(그림5)을 보자. 전통 초상화와 달리 흑백사진에는 찬(贊)을 쓸 여백이 없는 까닭에, 이건승과 황현의 경우에는 사진 화면을 직접 침범하는 것을 피하여 다소 조심스럽게 종이 액자나 사진 뒷면에 자찬을 써넣은 듯하다. 이에 반해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이 1896년 사신(당시의 직위명은 특명전권공사)으로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여하러 갔을 때 러시아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그림6)에 자찬을 적어 넣는 방식이 더욱 흥미롭다. 사진 우측 상단에 세로로 적어 넣은 시는 민영환이 당시에 친필로 쓴 것이라고 한다. 자찬을 적기 위한 자리로 사진의 여백을 과감히 활용하는 행위는 초상화의 여백에 찬을 써넣는 전통적인 화면 구성 방식을 고스란히 따른 것이다.
|
|
위에서 열거한 몇몇 사례들에서 보듯 자기 사진에 전통 초상화찬의 형식과 화법을 계승한 형태로 자찬을 썼다는 것은, 당대인들이 초상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사진을 이해했고 일종의 간소한 초상처럼 간주했음을 암시해준다. 초상의 배경에 찬을 쓰는 문화적 관습이 뿌리 깊게 지속되어오면서 사진에까지 그대로 적용되었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조지훈(趙芝薰, 1920~1968) 시인의 다음 시는 초상(혹은 근대에 들어서는 사진)에 대해 자찬을 짓는 식의 문화의식 내지 자기 표상의 전통이 20세기 중반에 들어서까지 또 다른 형태로 면면하게 이어지던 한 양상을 보여준다.
우주의 환영(幻影)
하나의 인간(人間)이 있으되
그는 이름이 없었으나 세상 사람이
짐짓 동탁(東卓)이라 부르더라.
이제 그를 모사(模寫)함은 환영(幻影)의 환영(幻影)이라
족(足)히 믿을 것이 없으니
이는 사위(寫僞)이기 때문이다.
辛巳 봄 於 月精寺 蘭若
東卓
조지훈이 흰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는 염주를 들고 굵은 테 안경을 쓴 채 월정사 뜰 9층 석탑 앞에 비스듬히 서서 찍은 자신의 사진 뒷면에다 적어 넣은 글이다. 이 글은 찬 혹은 한시 형태의 전통 한문학에 속하지는 않으나, 사진 속의 자기 이미지를 ‘하나의 인간’ 또는 ‘그’로 짐짓 타자화하는 방식이라든지, 실체의 모사(模寫)인 사진 속의 자신에 대해 “환영의 환영”이고 “그려진 거짓(寫僞)”이라고 판정하는 언술, 짧은 편폭과 간결한 문체 속에 작가의 자기 존재성 및 자신의 시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모두 담아내는 방식 등은 기실 초상자찬의 전통에 충실한 것이다. 조지훈은 유년기에 가학(家學)으로 한학(漢學)을 익힌 시인이니만큼 옛 문인들의 문집에서 초상자찬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가운데 초상자찬이 어떤 성격의 글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위와 같은 형태의 사진 뒷면에 적은 한글 시로 변주해 본 것이 아닌가 싶다. 시대가 이미 바뀌어 초상화 제작 대신 사진을 찍고, 전통적인 한시 대신 한글로 쓴 현대시에 주력했던 시인에게도, 초상을 매개로 한 자기 표상의 전통적 여운은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한문학과 한시의 시대가 저물고 한글로 된 현대시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자신의 시각 이미지와 엮인 시상(詩想)으로 자기 존재를 탐색하고 표현하는 문화의식의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태학사와 손을 잡고<한국학, 그림을 그리다>를 연재한다. 그림에 숨은 비밀과 사연을 프리즘으로 삼아 한국학의 출렁이는 바다로 여행을 떠나려는 것이다. 문학, 미술, 음악, 철학, 역사, 문화가 망라되는 항해에 깊고 진한 교감이 깃든 풍성한 바다가 펼쳐지길 해신(海神)에게 기도한다. 연재는 매주 1회 돛을 달고 항구를 떠난다.  http://www.thaehaksa.com
http://www.thaehaksa.com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도서 출간
네이버캐스트에 연재되었던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시리즈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대 인문학자 32인이 옛 그림을 호명해 되살려낸 한국학 읽기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글
- 김기완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및 연세대 강사. 한국 고전문학, 특히 한국 한문학을 전공하고 있다. 한국 고전문학과 전통시대 시각문화의 상호 접점을 탐색하는 작업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문학ㆍ회화ㆍ문화담론과 유행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전통시대 문화예술사 서술에 관심이 많다. 논문으로는 석사학위 논문인 <조선후기 사대부 초상화찬 연구>와 <노론의 학통적 맥락에서 본 송시열 초상화찬>이 있다.
- 이전글버터, 섬세한 맛의 승리 - 부드러운 맛에 면죄부를 발행하다 16.02.06
- 다음글친구와 그림 - 19세기 사대부가 그린 황량한 풍경의 사연 16.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