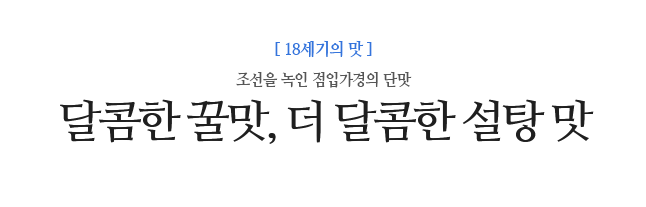테마로보는역사 달콤한 꿀맛, 더 달콤한 설탕 맛 - 조선을 녹인 점입가경의 단맛
페이지 정보

본문
선비의 집에 벌통이 놓인 사연
추수가 끝난 늦가을, 짚가리를 쌓아놓은 마당에는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인다. 일꾼 두 명이 마당에 앉아서 볏짚으로 ‘섬’을 만들고 있다. 그림의 한가운데에는 사랑채로 보이는 기역 자형 건물이 있다. 마루에는 정자관(程子冠)을 쓴 양반이 긴 담뱃대를 물고 바닥에 놓인 책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마당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지켜보는 중이고, 마루에 딸린 방에서는 나이 든 선비가 손자로 보이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다. 사랑채 마루의 섬돌 왼쪽에는 화로와 주전자가 놓였다. 아마도 찻물을 끓이는 데 쓰이는 듯하다. 그리고 그 옆의 돌담 옆에는 벌통이 두 개 보인다.
1 | 2 |
|
|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화가 김득신(金得臣, 1754~1822)이 그렸다. 그의 그림 〈풍속팔곡병(風俗八曲屛)〉 중 제7면에 나온다. 왜 이 집의 돌담 옆에 벌통이 놓였을까? 정민 교수의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김영사, 2011)에 의하면,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 사이에 일부 선비들 사이에서 차 마시기가 유행을 했다. 하지만 찻잎 구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찻잎을 구하지 못한 선비들은 대용 차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정을 바로 이 집의 벌통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세기 초엽에 쓰인 빙허각(憑虛閣) 이씨(1759~1824)의 [규합총서(閨閤叢書)] <다품(茶品)>에는 계장(桂漿: 오지로 만든 병에 꿀과 계피가루를 넣고 얼음이 든 물을 부은 후, 일곱 장의 기름종이로 병의 입구를 단단히 막고 보관한 다음에 하루에 한 장, 이레 때 모두 벗겨서 마시는 음료)ㆍ귀계장(歸桂漿: 당귀를 달인 물에 녹각교, 생강가루, 육계나무의 열매인 계심, 꿀 등을 차례로 섞은 후 두었다가 마시는 음료)ㆍ매화차ㆍ포도차ㆍ매실차ㆍ국화차 등이 나온다. 그중에서 계장ㆍ귀계장ㆍ포도차ㆍ국화차에는 반드시 꿀이 재료로 들어갔다. 가령 귀계장은 당귀ㆍ마른생강ㆍ계피껍질을 끓인 후 여기에 꿀을 타서 겨울에 마셨다. 특히 겨울에는 빈속에 반 잔씩 마시면 기운과 피를 아울러 보하기 때문에 ‘성약(聖藥: 효력이 매우 좋은 약)’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한다.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5) 역시 53세의 나이에 감기를 예방하고 겨울을 잘 나기 위해 1787년 11월 29일부터 ‘가감삼귤차(加減蔘橘茶)’를 마셨다([승정원일기] 정조 11년(1787) 11월 29일). 가감삼귤차는 인삼과 감귤 말린 것을 함께 달인 것이다. 개성에서 왕실에 올린 인삼과 제주도에서 올라온 감귤을 내의원의 의관들이 말려두었다가 달여서 올렸다. 이와 같이 약재를 넣은 차는 반드시 꿀을 타서 마셔야 그 쓴맛을 없앨 수 있었다. 가감삼귤차를 겨울에 왕이나 왕비, 혹은 왕대비에게 올린 일은 영조 때도 몇 차례 있었다.
양봉이 유행하다
꿀의 효용성이 알려지면서 양봉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18~19세기 조선에서 나온 농사기술을 다룬 책에는 양봉기술이 빠지지 않고 소개되어 있다. <출처: gettyimages>
꿀은 인류가 자연에서 발견한 단맛 덩어리다. 꿀의 효용성이 알려지면서 인공적으로 꿀을 생산해 이를 취하는 양봉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기 시작했다. 양봉기술에 대한 기록은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중국 책을 인용하여 양봉 항목을 소개한 이후, 18~19세기 조선에서 나온 농사기술을 다룬 책에 거의 빠지지 않고 소개되어 있다. 특히 빙허각 이씨는 [규합총서](<산가락(山家樂)>)에서 ‘양봉길일’, ‘벌 앉히는 법’, ‘통 앉히는 법’, ‘꿀 내는 법’을 다른 책에서 인용하고 자신이 정리해 적어두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18세기 조선에서 양봉기술은 산가(山家)의 선비나 주부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가짜 꿀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시필(李時弼, 1657〜1724)이 지은 [소문사설(謏聞事說)](백승호ㆍ부유섭ㆍ정유승 옮김, [소문사설, 조선의 실용지식 연구노트], 휴머니스트, 2011)에서는 “붉게 달군 부젓가락을 (꿀에) 넣었다 꺼냈을 때 향기가 나면 진짜고 연기가 나면 가짜다”라는 분별법이 별도로 적혀 있을 정도였다. 연기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은 색깔을 희게 만들고자 소변을 섞고 버드나무로 여러 번 저어서 거품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꿀이 얼마나 유행했으면 진짜와 가짜 구별법까지 등장했겠는가.
꿀과 함께 조청도 단맛을 내는 중요한 재료였다.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은 [산구준여변증설(山臞餕餘辨證說)]에서 다음과 같이 제밀법(製蜜法)을 다루었다.
찰기장〔粘秫黍: 찰기가 있는 기장〕 1두(斗)(를) 매우 세게 잘 씻어서 푹 찐다. 식기 전에 냉수 2병과 엿기름가루〔麥芽末〕 2승(升)을 잘 섞어서 항아리에 담는다. 가령 초저녁에 담가두면, 해가 짧을 때는 닭이 새벽에 울 때 꺼내면 된다. 해가 길 때는 아침에 해가 뜰 때 끄집어낸다. 명주 보자기에 담아서 걸러내면 맑은 국물이 나온다. 껍질과 씨앗을 뺀 대추를 넣고 그 즙을 네 번 진하게 달인다. 이것을 사기 항아리에 넣는다. 묽고 진하기가 꿀처럼 되면, 기름종이와 피지(皮紙)로 두 번 항아리의 입구를 봉한다. 사기접시로 위를 덮고 습하지 않은 땅에 묻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30일이 지나면 꺼내는데, 잘된 것은 마치 꿀과 같다. 한편 여기에 흰 사탕가루 4냥(兩)을 보태면 맛이 더욱 좋다. 우리나라에는 벌꿀〔蜂蜜〕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조청(造淸)이라 부른다.
그러니 여기에서의 밀(蜜)은 조청을 두고 한 말이다. 조청은 다른 말로 추청(追淸)이라고도 불렀다. 벌꿀을 대신하여 약과를 만들 때도 조청을 썼다.
이당(飴糖), 곧 엿도 단맛을 내는 일종의 가공음식이었다. 이규경은 엿을 만드는 재료로 멥쌀〔大粳米〕ㆍ찰기장〔粘秫〕ㆍ차조〔粘粟〕ㆍ찰수수〔粘蜀黍〕ㆍ좁쌀〔小米〕로 만든다고 했다. 찹쌀은 약엿〔藥飴〕을 만들 때 재료로 사용한다고 적었다. 이들 곡물로 밥을 지은 솥에 엿기름가루와 따뜻한 물을 넣고 솥뚜껑을 덮어 온기를 유지한다. 식지 않도록 보온을 해두면 반나절 정도 지나서 밥은 물로 변하면서 오로지 쌀 껍질만 남는다. 물을 걸러내서 이것을 졸이면 엿이 된다. 엿은 주로 단맛의 과자를 만들 때 이용하였다.
꿀보다 더 단 맛, 사탕
꿀보다 더 단 맛을 내는 식재료는 사탕이었다.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본래 인도의 갠지스 강 유역이 원산지로 알려진 볏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높이는 품종에 따라서 2~4미터에 이르며, 그 모양이 수수와 비슷하지만 사탕이 나온다고 하여 사탕수수라고 부른다. 설탕은 줄기에서 짠 즙으로 만든다. 줄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먼저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그리고 줄기에서 즙을 짜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구가 필요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거운 돌을 두 겹으로 쌓고 그 사이에 줄기를 넣은 다음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그러면 줄기가 짓이겨지면서 즙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즙을 내면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도 그 생산량은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윤차(輪車)다. 지금은 쇠로 된 것을 사용하지만, 처음에는 아마도 나무로 원통을 만들고 그 원통 끝에 바퀴를 조각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이것을 두 개 만들어 톱니바퀴를 옆으로 맞춘다. 그러면 원통의 위에 있는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고, 아래의 원통도 두 개가 서로 맞물린다. 두 개 중 하나의 톱니바퀴 위에 긴 막대기를 박아서 그것을 사람이 돌린다. 그러면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아래의 원통도 함께 맞물려 돌아간다. 이 틈에 사탕수수의 줄기를 넣으면 밑으로 즙이 나온다.
19세기 중반 아마미군도(奄美群島)의 금륜차. 〈출처: 名越左源太, [南島雑話], 東京:平凡社, 1984, 105쪽〉
이 책의 저자는 1850년에서 1855년 사이에 지금의 일본 가고시마현 남단 도서인 아마미군도에 유배되어 살았다. 그때 아마미군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글과 그림으로 남겼다.
처음에는 두 개의 원통을 사용했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즙을 짜내기 위해서 세 개의 원통을 서로 맞물린 후, 가운데 원통을 사람이나 말 혹은 소가 원형으로 돌리도록 했다. 그러나 나무로 만든 톱니바퀴는 쉽게 부서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개선한 것이 바로 금륜차(金輪車)다. 줄기를 압착하는 원통과 톱니바퀴도 쇠로 만들었다. 더욱이 세 개의 금륜차 원통이 맞물려 돌아가는 두 군데에 사탕수수의 줄기를 넣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즙을 짜낼 수 있었다. 이렇게 즙을 받으면 그것을 큰 냄비에 넣고 약 두 시간 정도를 약한 불에서 끓인다. 끓은 즙에 석회가루를 넣고 잘 저으면 즙은 점차 응고되기 시작한다. 이 즙이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긴 사각형의 틀에 이것을 붓는다. 칼로 조각을 낼 부분에 금을 그어두면, 굳은 후에 손쉽게 자를 수 있다. 그 색깔은 검은색이다. 보통 말하는 흑사탕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 정백제를 넣고 가루로 분쇄를 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설탕이 된다.
이규경, 사탕을 '점입가경의 맛'이라 평하다
|
|
이러한 사탕이 조선 사람들에게도 소개되었다. 하지만 한반도의 자연환경은 사탕수수를 재배하기에 알맞지 않았다. 그러니 일본이나 중국에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었다. 이규경은 <종자전당변증설(種蔗煎糖辨證說)>에서 당시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요사이 해내외에서 사탕수수를 심거나 사탕을 달이지 않는 자가 없고, 이것을 매일 언제나 먹는다. 심지어 여러 곳으로 사행을 떠나는 자들은 교통이 험악하거나 평탄함을 따지지 않고 서로 교역을 한다. 세상에서 비싼 재물이지만, 유독 나만 없다”고 했다. 연행사나 통신사를 따라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 이규경의 입장에서 사탕을 설명하려니 답답했던 모양이다. 결국 이규경은 오로지 중원의 자료와 의주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근거하여 사탕수수를 심고 즙액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 이 글에서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규경은 “또 흑당(黑糖)도 있다. 근래 서양의 배가 우리나라 동해 연안에 표류하여 배를 수색하여 검사해보니, 배에 흑당으로 가루를 낸 것을 많이 싣고 있었다고 한다. 맛은 백당보다 좋다고 전해진다”고 적었다. 이는 아마도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데지마(出島)로 가던 네덜란드 배였을 가능성이 많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흑당은 정백하지 않은 사탕을 가리킨다. 어쩐 일인지 이규경 역시 이 흑당을 맛보았던 모양이다. 그는 그 맛을 ‘점입가경의 맛(漸入佳境之味)’이라고 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비록 사탕의 맛은 보았지만, 그것이 나오는 사탕수수의 실체를 그는 보지 못했으니.
이규경은 중원에서는 언제나 사탕즙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벌꿀을 대신하였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사탕이 나지 않아 벌꿀을 대신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탕가루가 약재의 하나로 사용된 경우는 있었다. [승정원일기]에서는 다음(茶飮)이 쓴맛 때문에 먹기가 어려우면 사탕가루를 넣는 제법이 자주 등장한다. 가령 숙종 45년(1719) 11월 18일 왕이 입안이 담담하면서 입맛이 없는 구담(口淡)으로 인해서 수라를 들지 못하자, 의관들이 상의하여 귤피생강탕(橘皮生薑湯)을 끓여서 사탕을 넣어서 복용하시면 곧장 약효가 있다는 계를 올렸다([승정원일기] 숙종 45년(1719) 11월 18일). 이렇듯이 사탕수수가 재배되지 않았던 조선에서는 사탕이나 사탕가루가 적어도 19세기 중반까지 탕약에 넣는 약재의 하나로 쓰였다.
꿀과 달리 사탕은 조선 초기부터 주로 일본과 류큐(琉球)국으로부터 진상 받거나 수입했다. 가령 [조선왕조실록] 세종 3년(1421) 11월 6일에서는 일본국 전구주총관(前九州摠管) 원도진(源道鎭)이 사탕 100근(砂糖一百斤)을 조공으로 보내왔다고 적었다. 성종 8년(1477) 6월 6일에서는 류큐국 왕 상덕이 내원리주(內原里主) 등을 조선에 보내면서 사탕 100근을 조공으로 보내왔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 왕래는 결코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임란 전후에 왜관을 통해서 사탕을 수입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탕은 매우 귀한 약재였고, 왕실이나 부잣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 18세기 조선에서는 단맛의 원천을 꿀과 조청에서 주로 확보했다. 이에 비해 일본ㆍ류큐국ㆍ중국으로부터 확보한 사탕은 그것이 백사탕이든지 흑사탕이든지, 아니면 설탕이나 연백당(軟白糖: 솜사탕)이든지 간에 약재 혹은 단 맛을 강화하는 데 부분적으로 쓰였을 뿐이다. 인류학자 시드니 민츠(Sidney W. Mintz, 1922~ )가 밝혔듯이 서유럽에서도 설탕은 처음에 향신료와 의약품이었다. 18세기 이후 중앙아메리카에서 운영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은 설탕의 대독점가를 양산하였다. 설탕의 대량생산과 그로 인해서 발생한 설탕 위주의 단맛 소비는 사탕수수 농장주와 설탕 가공업주, 그리고 유통업주와 은행가, 노예상인들을 권력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정은 적어도 18세기 일본의 사쓰마번(薩摩藩)에 의해서 독점된 아마미군도(奄美群島)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도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20세기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설탕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불행 중 다행인 셈이다.
'18세기의 맛'은 한국18세기학회의 기획으로서, 문학동네와 함께 합니다. 
문학동네 네이버 카페
- 글
- 주영하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음식을 문화인류학, 민속학, 역사학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음식인문학자이다.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중앙민족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민속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아시아 음식의 문화와 역사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식탁 위의 한국사》, 《음식인문학》, 《음식전쟁 문화전쟁》, 《중국 중국인 중국음식》, 《그림 속의 음식, 음식 속의 역사》, 《차폰 잔폰 짬뽕》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중국음식문화사》가 있다.
저자의 책 보러가기
|
인물정보 더보기
- 출처
- 18세기의 맛: 취향의 탄생과 혀끝의 인문학 2014.02.28
-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의 18세기를 다채롭고 참신한 시각으로 연구하는 한국18세기의 학회의 첫 프로젝트 결과물, <18세기의 맛>이 책으로 나왔다. 18세기의 '맛'을 중심으로 세계사의 흥미로운 단면을 맛깔나게 서술했다. 23명 인문학자의 시각으로 18세기의 동서양을 뒤흔든 맛과 그 맛에 얽힌 흥미로운 현상을 살펴보는 일에 동참해보자.
책정보 보러가기
- 이전글조선후기 문화의 창, 북경 유리창 - 새로운 세계가 황홀경처럼 펼쳐지는 곳 16.02.06
- 다음글이인상의 서얼화 - 말이 끝나는 곳에서 그림은 시작된다 16.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