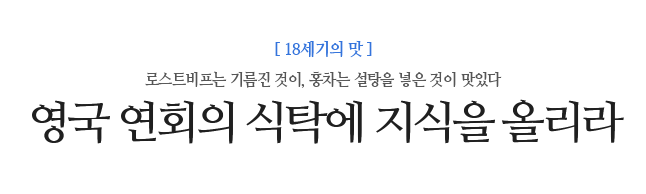테마로보는역사 영국 연회의 식탁에 지식을 올리라 - 기름진 로스트비프와 설탕을 곁들인 홍차
페이지 정보

본문
영국 식사는 기본적으로 다들 “맛이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엔 꽤 나아졌지만, 이는 카리브해 연안 지역이나 아시아에서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유럽 연합에 가입하는 등 20세기 후반의 정치ㆍ사회적 변동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의 식문화가 흘러들어 왔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영국 음식이라고 하면 풍성한 아침식사, 스테이크, 샌드위치, 푸딩, 그리고 홍차와 스콘 정도가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모두 18세기에 시작되었다.
고기 먹는 영국인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 〈오, 전통 있는 잉글랜드의 로스트비프!(O, the Roast Beef of Old England)〉
1748, 캔버스에 오일, 94.5×78.5 cm, 테이트 갤러리 소장. <출처: 네이버 미술검색>작품 보러가기
물론 옛날부터 고기는 먹었지만, 프랑스 요리에서 고기를 졸여 스튜로 만들거나 했던 데 비해 소스를 뿌린 로스트비프(roast beef: 큰 덩어리째로 오븐에 구운 쇠고기)나 스테이크가 전통적인 영국 요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다.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의 그림 〈오, 전통 있는 잉글랜드의 로스트비프!(O, the Roast Beef of Old England)〉(1748)에서는 영국에서 칼레(Calais) 항으로 운반되는 로스트비프 덩어리를 프랑스인 사제와 비쩍 마른 프랑스인 병사들이 침 흘리며 바라보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영국 상류계급의 저택에서도 18세기 초까지는 프랑스인 셰프가 만드는 프랑스 요리를 먹곤 했지만, 18세기에 북아메리카ㆍ인도 등의 식민지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전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영국에서는 프랑스 요리까지 공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영국 요리에 자부심을 갖고 영국식으로 먹는 것이야말로 영국인의 힘의 원천이자 미덕이라고 여긴 것이다. 호가스는 몇 번의 붓질로 로스트비프를 프랑스 항구로 운반해서 그러한 영국인의 자부심을 과시했다 하겠다. 실제로 18세기에 런던을 방문한 스웨덴인은 “영국인은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로스트비프를 잘 만든다. (…) 목장이 좋은 건지 도살 전에 살찌울 때 뭔가 비법이 있는 건지, 하여간 소고기든 송아지 고기든 양고기든…… 이 나라의 로스트비프에는 기름이 올라 있어서 맛있다”고 극찬했다.
로스트비프뿐 아니라 18세기 런던에서는 기본적으로 육식을 했던 듯하다. 1781년에 간행된 잡지에 실린 삽화 〈촙 하우스(A Chop House)〉(고기 요리를 파는 음식점)에는 존슨 박사(Dr. Johnson)와 친구 제임스 보즈웰(James Boswell)이 고기 요리에 몰두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존슨 박사도 보즈웰도 여기저기 선술집(tavern)이나 요릿집에 가서 늘상 외식을 했던 듯하다. 1763년 1월 19일 존슨의 일기를 봐도, 요릿집에 방을 잡아 “터키인처럼, 이라기보다는 존 불〔영국인〕처럼 실컷 비프스테이크를 먹었다”고 적혀 있다. 당시 중산층 이상의 런던 사람들은 뻔질나게 외식해서 비싼 고기 요리를 먹는 데 집착한 나머지 채소를 별로 섭취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참고로 영국식 아침 식사가 확립된 것은 1760년대 무렵이었던 듯하다. 일기를 보면 보즈웰도 이 무렵부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침을 먹었고, 존슨 박사도 홍차와 커피, 마멀레이드를 바른 스콘과 배넉(bannock: 보리빵과 오트밀로 만든 납작한 케이크)을 노동자의 아침식사로 권했다.
헨리 윌리엄 번버리(Henry William Bunbury), <촙 하우스(A Chop House)>
1781, 셰필드 박물관 소장.
아무튼, 18세기 영국인들이 고기를 먹는 방식은 ‘야만스럽게’ 비칠 정도였다. 식사 예절만 봐도, 전채부터 디저트까지 한 접시씩 가져오는 프랑스식이 아니라, 한 번에 아홉 접시 정도씩 내온 것을 마음 내키는 대로 가져가서 먹기를 세 번 반복하는 것이 매너였다. 당시 유럽에서 온 방문객들은 영국인들이 대화도 변변히 나누지 않고 묵묵히 먹기만 했다는 목격담을 전한다. 영국인들은 예절도 화술도 모르는 육식 인종이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다.
커피 하우스, 새로운 시민문화를 만들다
그러나 그렇게 거친 영국인의 식사에도 전혀 문화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또, 늘 그렇게 음울하게만 식사를 한 것도 아니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봐도 인간의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은 어떤 식재료를 확보해서 조리하여 소비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식사라는 행위, 여기서 생겨나는 감성, 사회생활 속의 연회(conviviality)라는 요소는 문화적 개성 확립의 중요한 요소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걸쳐 잉글랜드에서 크게 유행한 커피 하우스가 그 좋은 사례다. 원래 옥스퍼드에서 1650년 무렵에 생겨난 두 곳의 커피 하우스에서는 수상쩍은 검은 음료를 홀짝이면서 특히 자연철학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곤 했다(두 카페 모두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 풍습은 즉시 런던으로 전해졌고, 커피 하우스는 유동성이 강한 당시의 시대 분위기에 힘입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담소의 장으로서 극적인 성장을 거두게 된다.
조지 우드워드(George Woodward), 〈로이즈 커피 하우스(Lloyd’s Coffee House)〉
1798, 영국 칼크 수도원 소장.
사람들이 서로 신문을 읽고 정보를 교환하는 커피 하우스는 정보 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다. 각종 문학단체와 신문협회, 왕립협회(Royal Society)와 같은 과학단체, 주식ㆍ국채 거래와 같은 은행업, 로이즈 보험, 최초의 양대 정당 조직인 토리당ㆍ휘그당 등이 모두 그곳에서 탄생했다. 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근대 시민사회의 ‘공공성(Öffentlichkeit)’의 구조적 모델로 18세기 영국의 커피 하우스를 거론한 것은 탁견(卓見: 뛰어난 견해)이었다. 과학과 문화, 금융ㆍ경제활동, 해운, 저널리즘과 같이 ‘국가’와 ‘사적 공간’ 사이에 펼쳐진 ‘공공’ 공간에서 싹튼 근대 시민사회를 길러낸 것이 바로 커피 하우스였다. 정보가 공공의 장에서 교환되고 공유되어 ‘지식’으로 유통됨으로써 새로운 시민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루나 협회의 식탁에는 무엇이 올랐을까?
런던에서 커피 하우스가 쇠퇴하기 시작한 18세기 후반, 영국 중서부의 버밍엄(Birmingham) 시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공공 지식’을 형성한 연회의 장, ‘루나 협회(Lunar Society)’가 탄생했다. 당시 눈부시게 발전하던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이 괴상한 이름은, 가로등이 없던 시절에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이들이 보름달 뜬 밤에 모였다는 점에다, ‘정신이상자’를 뜻하는 단어 ‘루나틱(lunatic)’의 의미를 더해 참신한 발상을 가진 집단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모임이 언제 시작됐고 회원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루나 협회를 이끌었던 중심 인물인 불톤(Matthew Boulton, 왼쪽)과 에라스무스 다윈(Erasmus Darwin, 오른쪽).
그 중심인물은 영국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공장을 설립한 은ㆍ도금 제품 제조업자인 매슈 불톤(Matthew Boulton)과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할아버지인 의사 에라스무스 다윈(Erasmus Darwin)이었다. 뒤이어 미국의 자연철학 교수였던 윌리엄 스몰(William Small), 도자기 제조업자 조사이어 웨지우드(Josiah Wedgwood), 산소를 발견한 조지프 프리스틀리(Joseph Priestley), 증기기관 발명가 제임스 와트(James Watt) 등이 참가한다. 미국 100달러 지폐에 얼굴이 새겨진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도 영국을 방문했을 때 루나 협회에서 전기 실험을 했다. 대부분이 국교회(國敎會)에 속하지 않는 비국교도(dissenters)였던 그들은 과학 실험을 하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것을 실용화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모임은 1750년대에 알게 된 불톤과 다윈이 서로의 집을 드나들던 것이 시초였는데, 1765년에 스몰이 참가하면서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기할 것은 왕립협회나 옥스퍼드ㆍ캠브리지 대학을 좌지우지하던 이들이 대부분 학자나 연구자,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상류계급 사람들이었던 것에 반해, 루나 협회의 구성원은 상류계급 출신도 아니었을 뿐더러 모두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웨지우드는 초등학교, 불톤은 중학교까지 다녔다). 이른바 직공 계급, 전문직, 일반적인 지식인 계급이 루나 협회의 주축이었다. 바로 그들이 전기나 식물학 같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큰 관심을 갖고 차세대 과학기술을 생각하여 산업에 응용하는 데 정열을 기울이고 있었다. 불톤, 웨지우드, 와트야말로 증기기관을 낳고 산업혁명을 추진하여 영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루나 협회라는 지적 네트워크가 있었다.
장 에두아르 다르장(Jean-Édouard D’argent), 〈제임스 와트의 집에서 열린 루나 협회의 모임(Meeting of the Lunar Society at James Watt's House, Birmingham)〉
19세기, 영국 사이언스 박물관 소장.
실험도 하고 토론도 하는 한편, 그들은 모였을 때마다 틀림없이 식사도 함께했으리라. 다윈은 먹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거구이기도 했고, 버밍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귀가했을 리 없다. 그들은 진취적인 정신이 풍부했기에 프랑스 혁명에 공감했지만, 당시 물류 운송 방식이나 그들이 모인 지역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프랑스산 와인을 마시거나 프랑스식 식사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 지역의 에일(Ale: 영국의 맥주)로 건배하고, 영국식으로 여러 접시를 한 번에 내오게 해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접시를 가져가서 먹었으리라. 다윈은 지방 성분이 병을 낫게 한다고 주장한 의사였으니, 고기는 지방이 가득한 스테이크나 개먼(gammon: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로스트비프를 내놓았을 터. 영국 남부에서는 싫어하며 꺼렸지만 중북부에서는 많이 소비되던 감자ㆍ순무ㆍ귀리ㆍ보리로 만들어 버터를 바른 흑빵도 콩이나 양파와 함께 식탁에 놓였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겠다. 또 18세기부터 영국 요리로 정착하기 시작한 파이ㆍ타르트ㆍ푸딩도 식탁 위에 함께 올랐을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고기ㆍ생선ㆍ과일을 넣은 파이나 타르트를 자주 오븐으로 구워먹었는데 그 종류도 다양했다. 푸딩도 오븐에서 과자처럼 구운 것, 고기와 함께 졸인 것, 포타주풍으로 만든 것 등 그 종류가 50가지나 되었다. 때로는 실험하는 도중에, 샌드위치 백작이 그랬던 것처럼 고기를 빵에 끼운 샌드위치를 한입 가득 물었을지도 모르겠다. 식후에는 피크(Peak) 지방의 명물인 블루치즈를 먹었을 것이며, 이 시대 중류계급의 식탁에 침투한 홍차에 설탕을 넣어 마셨을 것이다.
식기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기를 자르는 나이프는 물론, 이때부터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포크, 볼 등의 은제품은 불톤의 공장에서 만든 것이 제공되었고, 탁상용 물주전자, 접시, 홍차용 도자기는 웨지우드의 공장 에트루리아에서 제조된 최신 제품을 사용했으리라 추측된다. 직사각형 식탁에는 인도에서 수입한 면으로 만든 흰 식탁보를 깔았을 것이고, 1800년경이 되면 방직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국내 생산에 성공하고 수출도 되기 시작한 영국제 면을 식탁에 깔고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둥근 식탁에서 식사를 했을 터이다. 식사나 실험이 끝난 뒤에는 리버풀 항구에서 가져온 미국산 기호품인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논쟁을 계속했을 것이다.
소비혁명과 여성들의 만찬회
같은 무렵, 런던의 비국교도 출판업자인 조지프 존슨(Joseph Johnson)의 저택에서도 프리스틀리를 비롯한 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이 모여 지적 네트워크를 이루었다. 그곳에서는 삶은 대구, 송아지 고기, 채소, 쌀로 만든 푸딩 같은 소박한 식사가 제공되었으니, 이를 생각하면 필자가 루나 협회의 식사를 너무 사치스럽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은 이러한 추측에는 사회적ㆍ경제적 근거가 있다.
우선, 17세기 후반부터 잉글랜드 동부에서 도입된 노포크 농법(Norfolk husbandry)이 동남부를 중심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효율적으로 경작지를 활용해 곡물 생산량을 늘리고 가축을 증산하는 데 성공했음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빵과 고기, 심지어는 채소까지도 풍부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곡물 수출도 증가했다. 18세기 중반, 잉글랜드는 ‘유럽의 곡창’이라 불릴 정도였다.
한편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던 영국은 해외와도 왕성하게 교역했다.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향신료나 차를, 서인도에서는 플랜테이션 농법으로 생산된 설탕을, 미국에서는 담배나 면화를 수입했다. 상류계급이 기호품으로 마시기 시작한 ‘설탕 넣은 홍차’는 높은 신분의 상징이었는데, 이러한 취미는 이윽고 중류계급으로 확산되었고 19세기에는 노동자들도 이 습관을 따랐다. 또한 설탕ㆍ담배ㆍ면화를 플랜테이션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강제 연행해서 노동력을 공급하려 했다. 악명 높은 노예무역이 시작된 것이다. 영국에서 술ㆍ장난감ㆍ무기류를 가져가서 아프리카에서 노예와 교환한 다음, 대서양을 횡단해서 서인도와 미국에서 노예를 팔고 다시 담배ㆍ면ㆍ설탕을 영국으로 가져와 유통시키는 삼각무역이 성립되었다.
이 무역을 통해 물자뿐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영국에 축적되었고, 이렇게 축적된 자본은 산업ㆍ금융 분야에 투자되어 다양한 사치품의 유통과 소비를 촉진했다. 설탕을 넣은 홍차의 유행과 함께 불톤의 공장에서 제조된 은ㆍ도금 제품이나 웨지우드의 도자기가 소비되었고, 이는 곧 소비혁명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한 소비혁명과 여성들의 지적 네트워크가 결합된 사례가 ‘블루 스타킹(Bluestockings)’이다. 블루 스타킹은 런던 중상류계급 지식인 여성들의 살롱을 통틀어 가리키던 말로, 부유한 가문의 엘리자베스 몬터규(Elizabeth Montagu)나 엘리자베스 베시(Elizabeth Vessey)가 집에서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문예와 문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사교집단을 뜻한다. 알코올은 일절 내놓지 않고 오로지 홍차와 세련된 화제만을 제공했다.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따분하기 그지없겠지만, 이 모임은 해나 모어(Hannah More)나 프랜시스 버니(Frances Burney) 같은 여성 작가들을 매료한 중요한 문화적 허브였다.
토머스 롤런드슨(Thomas Rowlandson), 〈블루 스타킹 클럽의 분열(Breaking Up of the Blue Stocking Club)〉
1815, 예일 대학교 루이스 월폴 도서관(Lewis Walpole Library) 소장.
그녀들은 홍차에 설탕이나 우유를 넣었을까? 샌드위치 정도는 먹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에 답해주는 풍자화가 있다. 토머스 롤런드슨(Thomas Rowlandson)의 〈블루 스타킹 클럽의 분열(Breaking Up of the Blue Stocking Club)〉(1815)이 그것이다. 공공권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던 여성 지식인들에 대한 공격은 1790년대부터 강해졌고, 이 그림이 그려질 무렵에는 그 압력이 한층 거세졌다. 이런 풍조 속에서 롤런드슨은 지식인 여성의 대명사인 블루 스타킹 여성들이 벌이는 처절한 한판 승부를 그림으로써, 여성의 지적 활동이 붕괴됨을 시사했다. 그림을 잘 보면 티포트와 컵이 둥근 식탁째 뒤집어지고 있고 설탕 그릇(sugar caddy) 같은 것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 바닥에는 산산조각 난 웨지우드풍 도자기와 흰 우유가 엎질러져 있고, 흰 빵도 굴러다닌다. 단, 이 시대에는 젖 짜는 여자(milkmaid)가 런던 근교에서 시내로 우유를 배달하고는 있었지만 가격이 비싸고 위생적이라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런던 사람들은 우유를 그다지 마시지 않았다 한다. 또 해나 모어 같은 사람은 노예무역 반대 운동의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이 정점에 달했던 1780년대에는 노예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인 설탕을 넣지 않은 홍차를 마셨을 터이다. 오늘날처럼 샌드위치 같은 것을 홍차와 함께 먹는 습관은 없었고 기껏해야 흰 빵 정도를 곁들였다.
아무튼 여성들의 이러한 티파티 또한 소비문화의 혜택을 입으면서도 공공성을 아우른 정보 교환의 장 역할을 했으며, 특히 문예 영역에서 ‘지식’을 사회에 유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남성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여성들의 연회(conviviality) 또한 공공 지식(public knowledge)을 퍼뜨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18세기의 맛'은 한국18세기학회의 기획으로서, 문학동네와 함께 합니다. 
문학동네 네이버 카페
- 글
- 오이시 가즈요시 (大石和欣) | 도쿄대학교 교수
- 18세기에서 19세기 초 영국의 채리티(charity), 공공권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2013년 3월에 [경계선상의 문학](공편ㆍ저, 일본 사이류샤), 2013년 8월에 [Coleridge, Romanticism and the Orient: Cultural Negotiations](공편ㆍ저, 영국 Continuum)가 출간될 예정이다.
- 번역
- 김시덕 | 서울대학교 연구원
- 고문헌과 고문서 연구를 통해 전근대 일본의 대외전쟁 담론을 추적하고 있다. 2010년 일본에서 간행한 [이국정벌전기의 세계―한반도ㆍ류큐열도ㆍ에조치](가사마쇼인)로 제4회 일본 고전문학학술상을 외국인 최초로 수상하였다. 2011년에 일본에서 간행한 2인 공저 [히데요시의 대외 전쟁](가사마쇼인)은 제2777회 일본 도서관협회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단행본 [그들이 본 임진왜란―근세 일본의 베스트셀러와 전쟁의 기억], [한 경계인의 고독과 중얼거림]을 비롯한 10여 종의 단행본, 공저, 번역서와 40여 편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저자의 책 보러가기
|
인물정보 더보기
- 출처
- 18세기의 맛: 취향의 탄생과 혀끝의 인문학 2014.02.28
-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의 18세기를 다채롭고 참신한 시각으로 연구하는 한국18세기의 학회의 첫 프로젝트 결과물, <18세기의 맛>이 책으로 나왔다. 18세기의 '맛'을 중심으로 세계사의 흥미로운 단면을 맛깔나게 서술했다. 23명 인문학자의 시각으로 18세기의 동서양을 뒤흔든 맛과 그 맛에 얽힌 흥미로운 현상을 살펴보는 일에 동참해보자.
책정보 보러가기
- 이전글마음을 그리다 - 마음을 다스리며 자신을 다스리다 16.02.06
- 다음글취선(醉仙) 이백을 그리다 - 술과 달, 방랑의 천재 시인 16.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